책 읽어주는 AI의 진화… 죽음 전할땐 착 가라앉은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컬처연구소]출판업계 ‘AI TTS’ 시대
음색 다양해져 감정 전달 더 섬세… 비용-시간 대폭 줄어 속속 도입
사투리 약하고 문장 길면 기계 티… 성우 대체 역부족, 저작권도 과제
보완할 점 많지만 ‘듣는 독서’ 성큼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 첫 문장을 오디오북으로 들어봤다. 마치 죽음의 의미를 곱씹듯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성우가 읽은 게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목소리다.
최근 ‘듣는 독서’가 진화하고 있다.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TTS(Text-To-Speech)와 AI가 결합하면서부터다. TTS는 일찍이 시각장애인이나 약시자 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술. 기존 TTS가 다소 기계음의 느낌이 강했다면, AI TTS는 사람이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휴지(休止)도 둔다. 취향에 따라 음색도 고를 수 있다.
최근 출판계는 AI 업계와 손잡고 AI TTS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서점 알라딘과 예스24,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리디, 윌라 등이 현재 AI TTS를 제공한다. AI TTS를 기존 TTS와 비교해 보기 위해 ‘이방인’을 두 버전으로 모두 들어봤다. 차이는 확연했다. 기존 TTS는 ‘죽었다’는 단어에 아무 감정의 깊이가 담기지 않았다. 반면 AI TTS는 쉼표와 마침표에서 확실히 한번 쉬어가는 게 느껴졌다. 3개 문장을 충분히 띄어서 읽다 보니 도입부의 충격을 곱씹는 데 도움이 됐다.

“사진사는 말한다 눈을 크게 뜨라고 하지만 나는 대답한다 이게 다 뜬 거예요”
전문 성우를 대체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한 전자책 업계 관계자는 “AI TTS로 한 2시간 듣다 보면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인다”며 “성우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다가온 ‘듣는 독서’의 시대
보완할 점들이 적지 않지만, AI TTS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듣는 독서’의 시대를 성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제작 비용이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 TTS는 전자책 파일만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AI TTS를 도입한 예스24는 보유한 전자책(150만 권)의 70%가량(104만 권)을 바로 AI TTS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AI TTS가 보편화되면 1인 창작자들도 손쉽게 오디오북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자가출판 플랫폼 ‘부크크’는 AI 전문 기업 ‘셀바스AI’와 협업해 1인 창작자들에게 셀프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 샘플을 녹음하면 음색과 말투를 복제해 오디오북을 만들어 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다만 저작권 및 권리관계는 큰 숙제다. 6월 서울고등법원은 윌라가 배타적 오디오북 발행권을 가진 도서 6권에 밀리의 서재가 TTS 기능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자책 업계 관계자는 “AI TTS 기술을 개발할 때 사람의 목소리가 데이터로 학습된다”며 “성우들의 목소리 저작권도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컬처연구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송평인 칼럼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5
40억 아파트, 방 한 칸 月140만원…집주인과 ‘동거 월세’ 등장
-
6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9
식당 눈물 뺀 ‘노쇼 사기단’…캄보디아에서 잡았다
-
10
여성 주변에 화살 쏘고 음주 도주한 20대男 “나무 향해 쏜 것”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5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6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9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10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트렌드뉴스
-
1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5
40억 아파트, 방 한 칸 月140만원…집주인과 ‘동거 월세’ 등장
-
6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9
식당 눈물 뺀 ‘노쇼 사기단’…캄보디아에서 잡았다
-
10
여성 주변에 화살 쏘고 음주 도주한 20대男 “나무 향해 쏜 것”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5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6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9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10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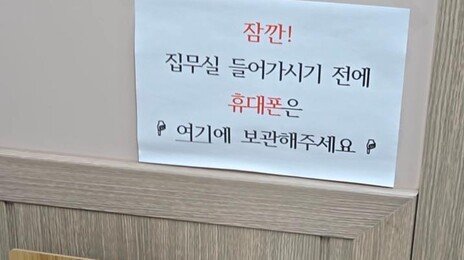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