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과 생존 사이… ‘혁명’ 맞닥뜨린 세 청년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초연 창작 뮤지컬 ‘데카브리’
19세기 ‘농노 폐지’ 러시아 혁명 배경
시대에 저항-순응, 일제강점기 떠올라

신념을 버려야만 살아남는 시대. 그러나 끝내 내려놓지 못한 자들.
10일 서울 종로구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개막한 초연 창작 뮤지컬 ‘데카브리’는 1825년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농노 폐지와 입헌군주제 도입 등을 주창했던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벌어진 직후가 배경이다. 극은 당시 감시가 일상화된 러시아의 어둡고 차가운 공기를 선명히 드러낸다.
이야기의 축은 미하일, 아카키, 알렉세이라는 세 청년의 삼각 구도다. 차르 비밀경찰인 미하일은 한때 문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던 전직 작가.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준비하던 시절 농노들을 계몽시키려 소설 ‘말뚝’을 쓰기도 했지만, 반란이 실패하고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한 뒤 사상을 꺾고 10여 년간 러시아 왕정에 복무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부하 아카키의 책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말뚝’을 다시 발견한다.
‘데카브리’의 힘은 세 주인공에 대한 입체적 표현에서 나온다. 살아남기 위해 신념을 접었지만 다시 각성하는 미하일과 혁명가의 얼굴을 감추고 일상을 살아가는 아카키, 우정이 유일한 약점이 되는 알렉세이까지. 각자의 선택이 맞물리며 긴장감을 선사한다.
물론 19세기 러시아라는 배경은 다소 낯설 수도 있다. 하지만 ‘감시와 지배 속에서도 빛을 내는 문학’이란 보편적인 주제는 울림을 준다. 무장해 맞선 이들, 교육과 글로 변화를 시도한 이들, 생존을 위해 순응하거나 침묵한 이들이 공존했던 일제강점기가 떠오르기도 한다.
무대는 절제미가 돋보인다. 과도한 장치 대신 조명과 정지된 호흡으로 ‘감시의 시선’을 재현했다. 주인공들이 신념의 대립을 드러내며 함께 부르는 넘버들은 서정성과 긴박함을 오간다. 키보드와 기타, 베이스, 드럼 4인조 라이브 밴드 역시 풍성하게 다가온다. 다만 넘버들이 한 번 들어서는 귀에 꽂히지 않아 난도가 조금 높다. 11월 30일까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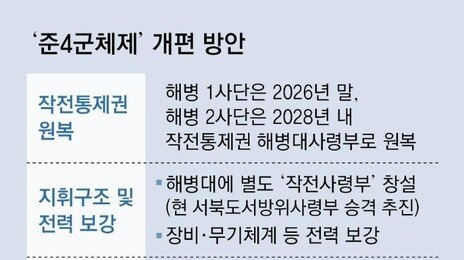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