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서 보험 가입 확인하고 경매 넘어가도 이사는 금물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위클리 리포트] 보증보험 구멍에 청년 세입자 흔들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계약 전 등기부-신탁 여부부터 확인
우선변제권 위해 확정일자 받아야… 이사 땐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약 시점과 거주 중, 이사할 때 등에 맞춰서 살펴봤다.①계약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를 드는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본 ‘을구’에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볼 수 있다.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된 부동산인지도 등본 ‘갑구’에서 살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사가 실질적인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해당 회사와 맺어야 한다. 신탁사와 계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살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는지도 국세완납증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금이 밀리면 집이 압류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②보증보험 가입: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다. 두 제도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반환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된다.
④거주 중: 만약 집에 살던 중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면 섣부른 이사는 금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누리려면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워 새로운 곳에 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⑤계약 종료·이사 전: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거나 혹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6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7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8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6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7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8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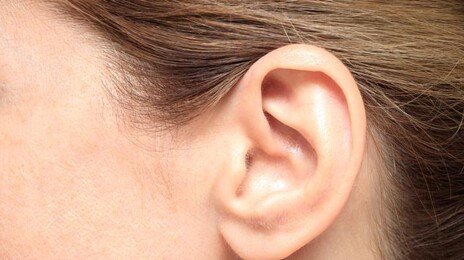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