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디자인은 진흥 대상 아닌 ‘미래 성장의 전략적 도구’[기고/안병학]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급진적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완전히 제조 형식이 낳은 산물이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품의 수요가 소비문화를 촉발하며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일의 가장 최전선에서 디자인은 멋진 상품의 포장과 광고로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의 경우 1960년대를 통틀어 연평균 41%의 세계 최고 수출 신장을 기록하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었다. 수출 목표 10억 달러 달성은 이상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었다. 이 시점에 제기된 수출 상품에 대한 품질 문제의 주원인이 상품 포장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수출 한국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국포장기술협회(1965년)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6년·이후 한국디자인센터,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를 한국수출품포장센터(1970년)로 흡수 통합하여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1970년)라는 국가 주도 기관이 발족했다. 그 후 창의적 공예 문화와 디자인 문화의 확산, 진흥을 통해 한국 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2000년)이 설립되어 주로 공예 관련 업무와 공공디자인진흥법 관련 진흥 업무를 주관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는 국제사회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지역성과 다양성을 향한 지평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예술, 시각디자인 분야가 이끌었다. 지금 케이팝과 드라마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며 우리 문화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에서도 문자 언어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과 무형의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주도하여 다룰 수 있는 핵심 역량, 그중에서도 문자 언어를 시각 언어로 번역, 해석, 표현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넓은 시야로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담아내는 전략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여유가 없다.
국가 주도 산업 성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디자인 진흥이라는 제한된 시야와 주어진 공공디자인 업무 수행 정도로는 디자인을 전략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없다. 과거 산업 사회의 국가 성장이 제조업 육성과 진흥에 있었고,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미래 성장은 시각문화를 어떻게 전략적 자산으로 디자인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식견과 시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시각문화를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확산할 강력한 디자인 기구가 필요하다. 산발적으로 기능하는 디자인 관련 조직의 기능을 통합, 총괄할 수 있는 상위 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디자인정책위원회’가 시급하다. 디자인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전략적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공성-사업성 함께 가는 도시정비계획 필요하다[기고/이창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5/13246816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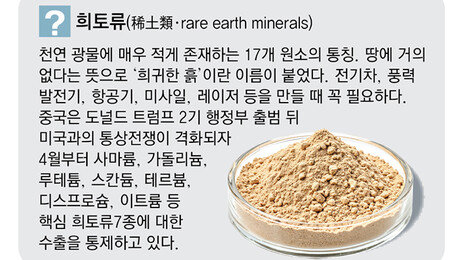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