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딩 때문에 치매”…前잉글랜드 주장 왓슨, 산재 인정 법정싸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9월 25일 17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왓슨(78)이 알츠하이머와 CTE로 투병 중이다. 그는 뇌 질환이 축구 경기 중 누적된 머리 부상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섰다.
■ ‘대표팀 주장’에서 치매 투병으로…산업재해 인정 요구
2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왓슨은 20년간 센터백으로 국가 대표팀에서 65회 경기에 출전했고, 세 차례 주장 완장을 찼다.
그의 아내 페니 왓슨(75)은 “수많은 헤딩과 충돌이 남편의 병을 불렀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 반복된 머리 부상, 산업재해 인정은 법정 다툼
왓슨 측은 선수 생활 중 10차례 공식적으로 기록된 머리 부상이 있었다며 ‘직업 중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구로 드러난 치매 위험, 가족의 호소
이 같은 논란은 축구 선수들의 두부 손상 위험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1924년부터 2019년까지 엘리트 축구 선수 6000명과 비선수 5만6000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축구 선수는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50% 높았다. 특히 필드 플레이어는 알츠하이머와 기타 치매에 걸릴 위험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니 왓슨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축구가 결국 치명적인 질병을 남겼다”며 “남편의 사례가 공정하게 다뤄지고,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가족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의 항소는 프로축구선수협회(PFA)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상급 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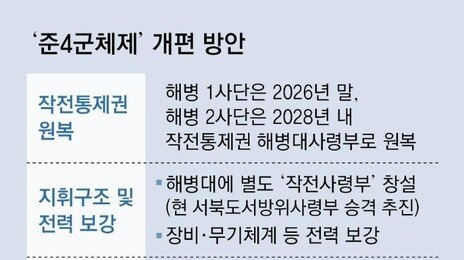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