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HD 환자 조시형, 치료 과정과 희망의 메시지 전하다 [이진한 의사·기자의 따뜻한 환자 이야기]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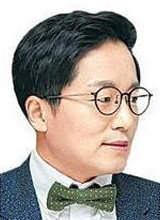
―GVHD는 어떤 질환인가.
윤재호 교수=“Graft-Versus-Host Disease의 앞 글자를 따서 GVHD라고 부른다. 공여자 면역세포가 환자 몸에 들어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반응이 심한 경우를 말한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50%에서 중증으로 발생한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이유는 환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 면역세포를 이식하면 그 면역세포가 환자의 암세포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여자 면역세포가 환자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에도 작용하지만 원치 않게 정상세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GVHD 진단은 언제 받았나.
조시형 환우=“2022년 2월에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한두 달 뒤 재발하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후 동생에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처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을 땐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유전자 검사 중 특이점이 있어 냉동해 뒀던 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림프구 주입술을 받았다. 이후 급성 GVHD가 발생하면서 고열과 붉은 반점, 부종, 진물 등 증상을 겪었다. 하루에 20회 가까이 설사도 했다. 침이 전혀 나오지 않아 입을 벌릴 때 점막이 벗겨지는 듯한 증상이 생겼다. 간 수치도 급증해 입원했고 4개월 정도 치료받았다.”
윤 교수=“1차 치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제다. 70∼80%에서 치료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2주 이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병이 호전되지 않거나 한 달 뒤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하다가 용량을 줄이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불응성 숙주 반응으로 진단한다. 스테로이드 불응성인 경우 치료가 어렵고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는 룩소리티닙(자카비)이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3차 치료제인 벨루모수딜(레주록)이라는 신약도 국내에서 승인됐다.”
―신약은 효과가 좋지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 환우=“그렇다. 3차 치료제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2차 치료제로 어느 정도 증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 만성 숙주병이 어느 곳에든 나타날 수 있어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 3차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환우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 환우=“투병할 때 사실 매일 모든 순간이 어려웠다. GVHD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 인식이 낮은 질환이다. 이번 기회에 이 질환이 많이 알려지고 신약도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되길 바란다. GVHD는 잘 치료받아 조절되면 3개월 또는 1년 뒤엔 저와 같이 좋아진다. 당장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길 바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6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9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10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靑, 정기인사 미루라 지시하며 퇴직 압박”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6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9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10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靑, 정기인사 미루라 지시하며 퇴직 압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