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보미]꽁꽁 숨긴 싱크홀 정보… 발밑은 더 불안하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는 100%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이 굴착공사장을 직접 찾은 건 3월 강동구 명일2동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이후다.
오 시장의 말과 그 뒤 서울시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확대’를 대책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상하수도관은 지하 1∼2m에 묻히고, GPR도 지하 2m 이내 비교적 얕은 땅속 상태만 알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달리던 차가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대형 싱크홀은 깊은 지하 굴착공사 주변에서 토사가 과도하게 유실되며 생긴다. 지금도 대부분의 굴착공사장에는 지질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아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2019년 12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각각 1명씩 목숨을 잃었을 때도 전문가들은 굴착공사를 주원인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상수관로 파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등 애매한 표현으로 뭉뚱그렸다. 굴착공사가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서울시도 배상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 도로를 싱크홀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둔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GPR 탐사 차량을 어디에 먼저 보낼지 정하는 데에만 쓰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지난달 24∼26일자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시리즈에서 한국지하안전협회와 서울시 싱크홀 위험지도를 제작, 공개한 이유다. 싱크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알려 굴착공사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였다.
이후 서울시 안전지도에 대한 공개 요구가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여전히 회의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을 마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더 불안하다.
안전 관련 정보는 공개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검증하고 수정하고 활용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어쩌다 한 번 점검 오는 공무원보다 매일 동네를 오가는 주민이 싱크홀 조짐을 먼저 알아차리기 쉽다. 명일2동 사고 조짐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도 인근 주유소 사장이었다. 굴착공사장 주변의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관찰할 때 공사 현장도 더 안전의 끈을 조일 것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
2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3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4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5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6
“내가 바나나야” 원숭이 유인하려 주렁주렁…선 넘은 관광객
-
7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
8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흑백요리사’ 임성근, 이레즈미 문신 의혹에 “타투 좋아보여서”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트렌드뉴스
-
1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
2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3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4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5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6
“내가 바나나야” 원숭이 유인하려 주렁주렁…선 넘은 관광객
-
7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
8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흑백요리사’ 임성근, 이레즈미 문신 의혹에 “타투 좋아보여서”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권형]‘삼성 팹 이전론’ 혼란 한 달째… 與 지도부가 조정, 정리 나서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0/13319835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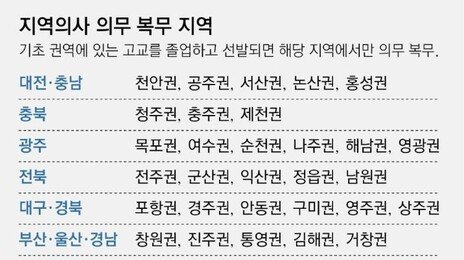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