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이 될 민노총의 ‘불법 파업’[오늘과 내일/김재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23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운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이 민노총의 마지막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의 투쟁 기조가 변해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파업의 대상과 명분이 크게 확대돼 불법 파업이 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 족쇄 풀어줄 노란봉투법
경제계는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후폭풍을 특히 우려한다. 현행 노조법에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한정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법안은 5건인데, 그중에선 단순히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법안까지 있다.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진짜 폭탄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다. 노동쟁의가 있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는데, 노란봉투법은 ‘결정’이라는 표현을 뺐다. 단 두 글자지만 차이는 엄청나다. 지금은 임금 협상 등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 전반으로 분쟁이 확대되면 해고자 복직, 부당 노동행위 철회 등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정부 정책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처분 권한 밖인 정치파업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조엔 큰 부담이 없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파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만 믿고 무작정 칼자루를 쥐여 줄 순 없다.
최저임금처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장관이 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이지 노란봉투법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17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 것처럼 노조법 개정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좋게 봐도 수단일 뿐인 노란봉투법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김승련 칼럼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4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5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6
[단독]차라리 제명 당하겠다던 김병기, 결국 탈당계 제출
-
7
北서 넘어온 멧돼지?…서해 소청도 출몰 두달만에 사살
-
8
임성근, 옷 속 ‘이레즈미’ 포착…‘기만적 자백’에 등 돌린 민심
-
9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10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안 의결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4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7
이란 마지막 왕세자 “이란, 중동의 한국 돼야했지만 북한이 됐다”
-
8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9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10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트렌드뉴스
-
1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4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5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6
[단독]차라리 제명 당하겠다던 김병기, 결국 탈당계 제출
-
7
北서 넘어온 멧돼지?…서해 소청도 출몰 두달만에 사살
-
8
임성근, 옷 속 ‘이레즈미’ 포착…‘기만적 자백’에 등 돌린 민심
-
9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10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안 의결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4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7
이란 마지막 왕세자 “이란, 중동의 한국 돼야했지만 북한이 됐다”
-
8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9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10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09.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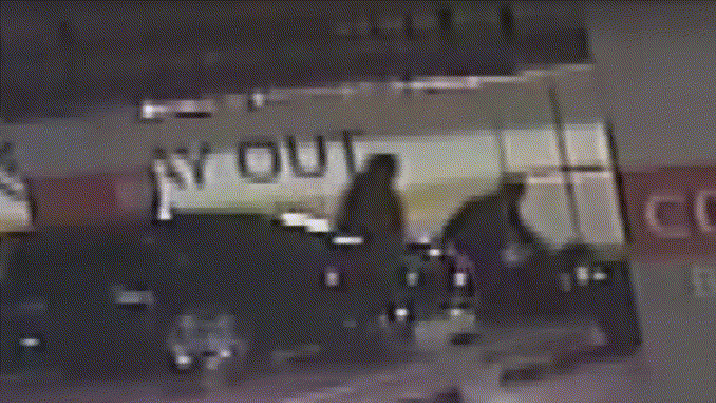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