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문과 놀자!/어린이과학동아 별별과학백과]따뜻해진 동해… 무시무시한 ‘죠스’ 사냥터 됐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뜨거워진 적도 열, 동해까지 유입… 표층 수온 57년동안 2.04도 상승
삼치-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 증가
백상아리 등 먹이 쫓아 점차 북상
상어 분포 지도 제작 등 연구 시작

올해 4월 8일 경북 울진군 후포항 근처 바다에 쳐 놓은 그물에 몸길이 3m, 몸무게 229kg 크기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청상아리는 원래 먼바다에 사는 상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지에서 불과 5.5km 떨어진 곳에 나타났지요. 먼바다에 사는 상어가 점차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오는 원인은 바닷물의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한국 바다에는 상어 약 49종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주로 서해, 남해에서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서해, 남해 수온은 15도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수심이 얕아서 상어가 머물기 적합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동해에서 혼획(混獲·특정 물고기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되는 상어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1건이었던 동해의 상어 혼획 건수는 2023년 15건, 2024년에는 4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 24일까지 12마리의 상어가 혼획됐지요.
● 따뜻해진 동해 상어 먹잇감 늘어
그런데 최근 동해에서 청상아리, 백상아리 등 공격성이 강한 상어 종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예전보다 더 큰 상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최윤 명예교수는 “2014년만 해도 동해에서 3m보다 큰 청상아리를 보기 힘들었는데, 2020년대 들어 3m보다 큰 개체가 자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해 근처 어민들은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어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합니다. 강원도 해수욕장에는 상어를 막는 그물망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최 명예교수는 “2023년 이전엔 그물망을 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상어에 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에 상어가 나타난 것은 온도와 먹이 분포 등 동해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0.5도만 올라도 양식 어류가 떼죽음을 당할 만큼 바다 생물들은 작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57년 동안 평균 1.58도 올랐습니다. 특히 동해는 2.04도 상승했지요. 2024년 동해의 표층 수온은 역대 최고인 18.84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동해에서 잡힌 물고기 중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방어, 삼치, 다랑어는 상어의 먹잇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4년 동해에서 잡힌 상어 28마리를 해부해 위장에서 난류성 어종들을 확인했습니다. 최 명예교수는 “같은 상어 종에서도 큰 개체가 동해에 나타난 건 큰 먹잇감인 다랑어 등을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동해안 중심으로 시작된 ‘상어 연구’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에서 잡힌 상어 무늬와 이빨을 분석해 나이, 특성 등 통계를 냅니다. 2022년 이전 한국에선 상어의 분포나 이동 경로 등을 국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어가 널리 쓰이는 수산물이 아닌 데다 자주 나타나는 생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상어가 많이 발견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대 수의학과 김상화 교수 연구팀은 ‘환경 DNA(eDNA)’ 기법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상어 분포 지도를 그립니다. eDNA 기법은 바다 곳곳에서 채집한 바닷물 속 생물의 점액이나 피부조직 등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어 종이 어디에 다녀갔는지 알 수 있지요. 김 교수는 “상어 분포 지도를 활용해 동해의 생태계 변화를 관리하고 어업 지역이 상어 활동지와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7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0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7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0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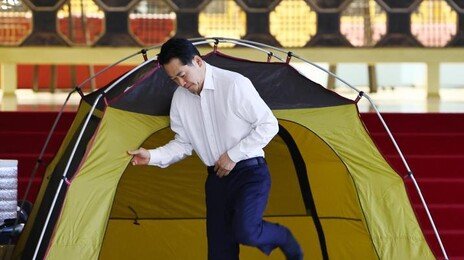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