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황혼의 악수[이준식의 한시 한 수]〈326〉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여러 해 못 만났다, 만나고 나니 외려 마음이 아리네.
싸락눈처럼 쏟아지는 내 눈물. 아, 자네 머리는 명주실처럼 하얘졌구나.
비탄에 잠긴 채 서로 손을 맞잡은 지금, 하필이면 꽃이 지는 시절이라니.
(年年不相見, 相見卻成悲. 敎我淚如霰, 嗟君髮似絲. 正傷携手處, 况値落花時. 莫惜今宵醉, 人間忽忽期.)
―‘옛 친구를 만나(봉고인·逢古人)’ 제1수·두목(杜牧·803∼852)
시는 친구와의 재회를 빌려 늙음과 세월의 속절없음을 조곤조곤 짚어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시인은 뜨거운 포옹 대신 묵직한 한숨부터 터져 나온다. 왜일까. 그건 아마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늙어감을 슬쩍 들여다보게 됐기 때문일 터. ‘비탄에 잠긴 채 손을 맞잡은 지금’이라는 대목은 마치 인생의 해 질 녘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하다. 꽃이 지고, 해가 기울고, 사람도 어느덧 황혼 무렵…. 시인은 말한다. ‘오늘 밤은 여한 없이 한껏 취해보세.’ 돈독한 우정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마치 덧없는 삶을 위로하려는 안간힘이자, 무심한 세월을 향한 조용한 반격인 듯도 하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시론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7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0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7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마두로 체포, 왜 ‘데브그루’ 아니고 ‘델타포스’가 했을까?
-
10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우뚝한 젊은 결기[이준식의 한시 한 수]〈327〉](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7/31/13211067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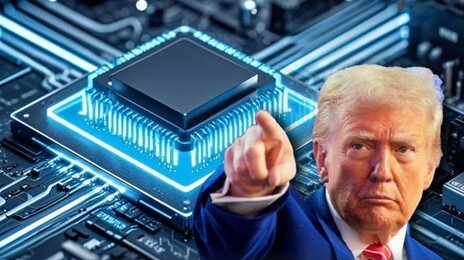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