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험 좀 못 봐도 괜찮다’ 해도 못 믿는 10대[김지용의 마음처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7일 2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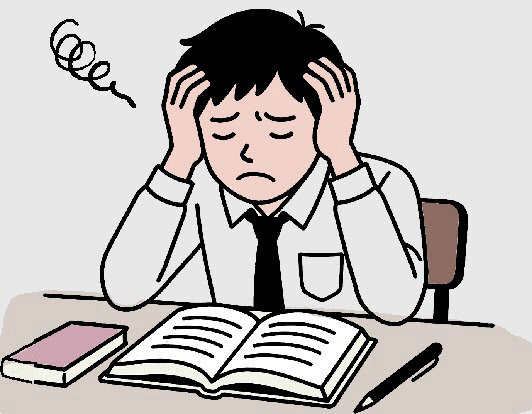

‘10만 명 중 8명도 안 되는 문제로 왜 호들갑이냐’고 말할 이들도 있겠지만, 이는 명백한 문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교생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1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사고나 질병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심해지는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다. ‘예전에도 그랬다’, ‘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다. 좋은 성적만이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주입된다. 성적이 떨어지면 인생이 끝났다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는다.
서로를 비교하고 줄 세우는 데 익숙한 집단주의 문화 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삶의 격차가 더 쉽게 드러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더욱 심화됐다. ‘경제적 성공과 그에 도달하기 위한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만 삶의 의미를 두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패배자라 여긴다.
이미 힘들어진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요즘은 경쟁이 당연하다’며 방치할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 성공과 성적이 중요한 가치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삶의 의미는 다양한 조각들을 천천히 모아 가며 찾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지용 연세웰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2017년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채널 ‘정신과의사 뇌부자들’을 개설해 정신건강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7월 기준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27.9만 명이다. 에세이 ‘빈틈의 위로’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 원장의 ‘한국의 10대들이 힘든 이유’ (https://youtu.be/U-RIU_iTqsU?feature=shared)
마음처방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시론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8
이효리 부부 “구아나가 떠났습니다”…15년 반려견과 작별
-
9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10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1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2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9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8
이효리 부부 “구아나가 떠났습니다”…15년 반려견과 작별
-
9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10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1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2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9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리튬, 치매의 벽 넘을 열쇠 될까[김지용의 마음처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24/13224543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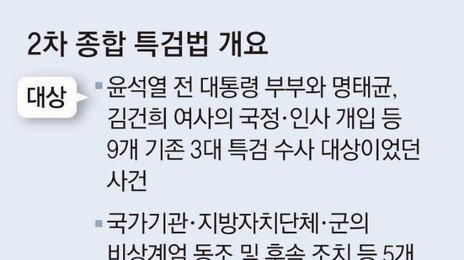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