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공부 안 돼 고민하던 때 테니스가 절 살렸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31일 23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동안 테니스를 잊고 살았었어요. 중고교 시절 테니스 선수였고, 대학도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선수 생활하며 어느 순간 ‘난 엘리트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테니스를 등한시했죠. 미국 유학 시절 잠시 장학금을 받기 위해 테니스 수업을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박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복식 파트너 역할도 했다. 그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아버지께서 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복식 파트너로 삼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언니 소개로 서울 진선여중에 테니스 선수로 입학했다. “제가 6학년 때 진선여중 2학년이던 언니가 테니스 감독인 담임 선생님이 선수를 찾고 있다며 제게 테스트받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약 두 달 뒤에 다시 라켓을 잡았다. “테니스 생각만 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늘 풀이 죽어 있던 박 교수를 본 어머니가 ‘그렇게 테니스가 좋으면 다시 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아버지께서도 ‘정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넌 능력이 안 된다. 나중에 부모 원망하지 마라’고 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진선여고 2학년이 돼서야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고만고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죠. 운동을 잠시 놓았다 다시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그래도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해 틈틈이 공부한 게 큰 힘이 됐어요.”
숙명여대 행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했다. 199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테니스 선수 경험 덕분에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스포츠 문화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옮겨 세계의 문화를 더 심도 있게 공부했다. 2008년 ‘육체 식민주의: 식민지 조선의 의학, 재생산, 그리고 인종’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운동선수 시절부터 인간의 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게 됐다”고 했다.
“테니스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체력과 뛰는 겁니다. 뭐든 기본이 잘돼 있어야 합니다. 테니스도,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중간 이상은 합니다. 유학 시절 테니스가 절 살렸다고 생각해요. 라켓으로 공을 치다 보면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재충전되는 느낌이랄까. 회원들과 어우러져 치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 재밌어요. 체력이 좋아져 연구에 집중도 잘되죠. 이런 테니스를 이젠 평생 절대 놓을 수 없죠.”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서영아의 100세 카페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2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5
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3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트렌드뉴스
-
1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2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5
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3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테니스는 인생 축소판…기본기 중요하고 흥분은 금물”[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01/13211326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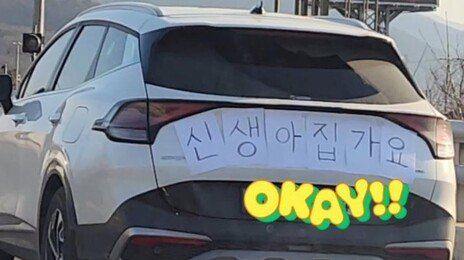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