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우뚝한 젊은 결기[이준식의 한시 한 수]〈327〉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비래봉 위 높다라니 우뚝 솟은 탑,
듣자니 닭 울면 해가 솟는다 하네.
뜬구름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음은
(飛來山上千尋塔, 聞說鷄鳴見日昇. 不畏浮雲遮望眼, 自緣身在最高層.)
―‘비래봉에 올라(등비래봉·登飛來峰)’ 왕안석(王安石·1021∼1086)
장엄한 일출의 찬가가 아니다. 새벽빛을 밀고 올라오는 태양처럼 시인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려는 결연한 결기를 보여준다.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은’ 기개는 장차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의 중상모략에 대한 은유적 응답이다. 이는 시인이 도덕적 고결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어 가능한 것이다. 청운의 뜻을 품은 서른 살 관리 초년생은 이렇듯 개결(介潔)한 이상, 사회 개혁의 소명의식을 한 편의 짤막한 시로 응축한다. 실제 자신이 신법을 추진하여 개혁을 본격화하기까지 아직은 15, 16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지만, 치열한 에너지는 진작부터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사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2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5
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3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트렌드뉴스
-
1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2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
5
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
10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3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7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8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피서의 참맛[이준식의 한시 한 수]〈328〉](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07/13214716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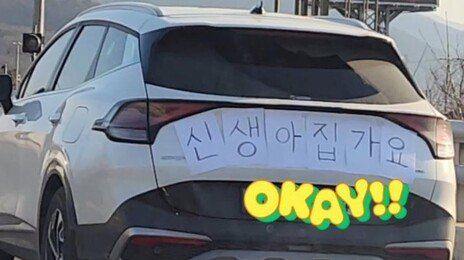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