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문과 놀자!/인문학으로 세상 읽기]한자 5만자 대신 세종의 한글 28자… 백성 삶의 질 높였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다음 달 9일은 제579돌 한글날
글 모르는 백성 위해 훈민정음 창제
‘지식 독점’한 양반 반대에도 강행
쉽게 익히는 소리글자, 우수성 입증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훈민정음 서문’은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글입니다. 세종대왕은 한문으로 이 내용을 작문하고 ‘훈민정음(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 맨 앞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나랏말미’로 시작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世宗御製 訓民正音)’은 세종의 아들 세조 때 만든 우리말 번역문인 언해본입니다.
●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이 만든 훈민정음
‘우리글’이 없어도 당시 지식인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했던 한자로 얼마든지 글을 쓰고, 시를 짓고, 상소를 올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님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우리글’을 만든다고 시간과 공을 들이며 글자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지식인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말들도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그런 일을 해서 좋을 게 무엇이냐고 신하들이 뜯어말리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서문의 첫 문장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통하지 않는다’입니다. 얼마나 기백이 넘치는 문장입니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기에 어리석은 까막눈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문서화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붙여 놓은 ‘방(안내문)’도 읽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했음이 느껴집니다. 글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종대왕은 이를 가엾게 생각합니다. 그가 가졌던 측은지심(惻隱之心). 백성을 돌보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따스한 연민이 축적되어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글자를 만들게 된 것이겠지요.
● 세상 만물을 표현할 수 있는 ‘28자’
이 질문에 세종대왕은 ‘28자’라고 답합니다. 28자로 10만 개, 그 이상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뜻글자인 한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글자를 창제했던 걸까요? 반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한 창의성과 합리성은 실로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창조이고,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도 모른 채 허덕이며 쫓아가기 바쁜 일상 속에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글은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보낸 인고의 시간, 용기, 결단력, 그리고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한글날입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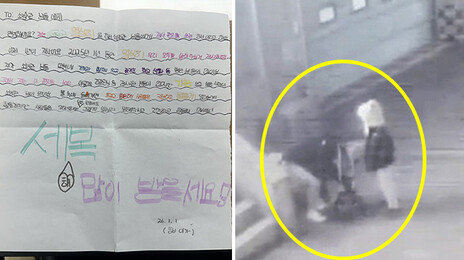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