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유종]비수도권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범사례 한두 곳부터 해보자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동아일보 1985년 12월 27일 자 10면. 1986학년도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추정한 결과 상위 6번째 그룹에 부산대와 경북대 영어교육과가 고려대 경영학과, 연세대 법학과와 함께 포함됐다. 부산대와 전남대 의예과는 서울대 섬유공학과, 천문학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입시 배치표가 대학 순위와 역량 등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모집, 연구 성과, 브랜드 파워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입시에서 선호하는 대학에 비수도권이 밀리는 건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17일 123대 국정과제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포함하고 비수도권대에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감소,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대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수도권대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2004∼2009년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약 1조 원이 투입됐고 2009∼2012년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인재 양성 사업엔 연간 약 1000억 원이 들어갔다. 10개 비수도권대를 한꺼번에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학과에 투자하기보다는 양자역학, 휴머노이드, 바이오 등 일부 미래 학문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서울대, KAIST 등이 아직 글로벌 경쟁에서 제대로 선점하지 못한 분야는 많다. 해외 대학도 아직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 분야를 선점해 명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학내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더 강력한 연대도 필요하다. 진심으로 비수도권대를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성과를 공유할 기관은 사실상 지자체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교원 처우를 상향 조정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대부분 주립대로 운영되는 독일 대학들은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만 거쳐 입학한 범재들을 글로벌 영재로 키우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대학 신설도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해도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 전체 역량만 분산시킬 뿐이다. 진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대학을 신설할 예산으로 기존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낫다.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크게 성장할 비수도권 사립대도 많다. 수십 년째 헛도는 ‘비수도권대 살리기’ 정책이 이번이라도 성공하려면 실행 가능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하는 게 어떨까.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초대석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김상운]중국 패권주의 돕는 미국 우선주의 역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8/13242019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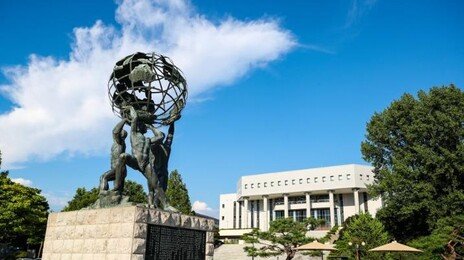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