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내 수술 동의서는 누가 사인해줄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23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얼마 전 다리 절단 수술을 집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겪은 일이다. 그의 70대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무릎 아래로 잘라 내려면 하루빨리 수술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어 수술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큰 수술이라 보호자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은 연락 두절 상태였다. 수소문한 끝에 조카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러다간 절단 수술 부위가 허벅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환자 담당 사회복지사까지 나선 끝에 조카와 겨우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의료진의 읍소에 마지못해 서명하면서 앞으론 어떤 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피보다 진한 사이여도 가족 아니면 불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은 환자는 수술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에선 수술 동의 절차를 중시한다.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건 의료진의 법적 의무인 동시에 의료 사고에 대비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환자가 멀쩡할 땐 직접 서명하면 되지만 응급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때도 있다. 이 경우 보호자가 대신 서명하는데 보호자의 범위가 좁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 민법이 규정한 가족으로 제한돼 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한 ‘피보다 진한’ 관계여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일분일초가 급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올해 전체 가구의 42%까지 늘어난 1인 가구는 또 어쩔 것인가.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할 때 누가 수술 동의서를 써주고 돌봐줄 것이냐는 이들의 가장 큰 근원적 공포다.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에 묶여 있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진다. 책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의 저자 은서란 씨는 5년간 함께 산 친구를 딸로 입양했다. 둘 중 하나가 아플 때 도울 수 있으려면 그 방법뿐이었다고 한다. 젊은 세대는 이런 대책이라도 세우지만 1인 가구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대는 70대 이상 노년층이다. 시대착오적인 수술 동의 제도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건 노인들이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뿐 아니라 친한 친구도 환자 대신 의료적 결정을 할 수 있게 열어놨다. 우리 역시 환자가 친밀한 사람을 사전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2022년 법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친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의료 사고 나면 손해배상은 누가 받느냐는 등의 논란 속에 흐지부지됐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두 성인이 합의하면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생활동반자법도 발의돼 있지만 동성애를 용인한다는 일각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 그사이 가족의 범위를 넓혀 서로 지탱해주는 관계를 늘리자는 본질은 흐릿해지고 있다.
돌봐줄 관계 못 넓히게 막으면 모두가 피해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정임수]기재부 죽이고 금융위 살린 ‘묻지 마’ 개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01/13250864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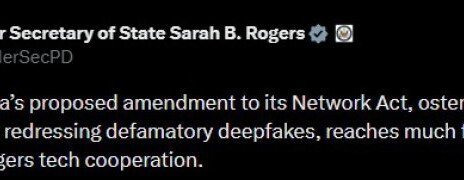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