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땅 굴착공사, 싱크홀 감지기도 없어… 소장은 “지반 좋다”[히어로콘텐츠/크랙中-②]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중〉굴착공사 현장점검 동행해보니
계측기 설치 지점 제멋대로 바꾸고
붕괴 막는 버팀보 주변엔 설치 안해
점검단 “붕괴 조짐 모를수도” 지적
지하터널 공사장 바닥엔 물 가득
비용탓 방수 대신 배수… 안전 우려
현장선 “30년 작업했는데 문제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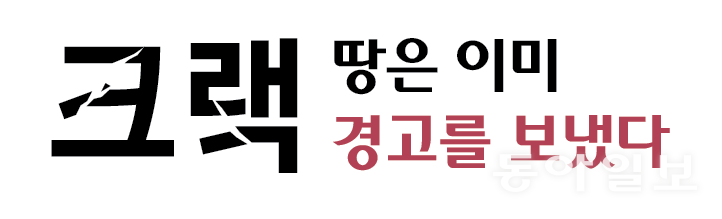

점검단은 공사장 입구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콘크리트 기둥부터 살폈다. 표면에 균열이 보였다. 이곳 지반은 돌이 아니라 흙이 대부분이었다. 지반이 단단하면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토류판(흙막이 벽체)을 쓴다. 반면 지반이 붕괴되기 쉽거나 불안정한 곳은 콘크리트 기둥을 쓴다. 콘크리트를 타설해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시공이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이곳은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다.
계측기 설치 지점을 마음대로 바꾸면 싱크홀 조짐을 감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점검단 관계자는 “애먼 곳에 계측기를 설치하면 붕괴 조짐을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공사장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버팀보들 주변에도 계측기가 없었다. 흙더미가 누르는 하중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였다. 바로 위에는 덤프트럭, 중장비 차량 등이 지나다녔다. 점검단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할 때 불안하지 않냐. 수천억 원을 쓰는 공사인데 계측기 비용 2억∼3억 원을 아끼느냐”고 지적했다.
●비용 아끼려 방수 대신 배수… 공사장은 물바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는 대형 싱크홀이 왜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기사로 소개합니다. 디지털 인터랙티브 버전 ‘크랙’ 시리즈는 25일 오전 3시 온라인 공개됩니다.
▶크랙 디지털 인터랙티브 기사 보기
https://original.donga.com/2025/sinkhole2
히어로콘텐츠팀
▽팀장: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취재: 공승배 주현우 기자
▽프로젝트 기획: 임상아 ND
▽사진: 홍진환 기자
▽편집: 이소연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
▽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ND
▽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이형주 인턴
https://original.donga.com/2025/sinkhole2
히어로콘텐츠팀
▽팀장: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취재: 공승배 주현우 기자
▽프로젝트 기획: 임상아 ND
▽사진: 홍진환 기자
▽편집: 이소연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
▽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ND
▽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이형주 인턴
도심 싱크홀 공포 >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7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이부진, 백화점 찾아 옷 입어보고 쿠킹클래스까지…무슨 일?
-
10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9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10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7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이부진, 백화점 찾아 옷 입어보고 쿠킹클래스까지…무슨 일?
-
10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9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10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