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84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5일 15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윤 교수는 재활에 성공했지만 최근 재발해 투병해 왔다.
윤 교수는 통영군 장승포읍(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태어났다. 한영고와 경희대 생물학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5년 한국교원대에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Song의 지리적 변이’ 논문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2006년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까지 명예교수를 지냈다.

윤 교수는 2006년 겨울 두루미를 보러 강원 철원군에 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왔다. 하지만 왼손 젓가락질로 하루 콩 100개씩 옮기는 훈련 등을 거쳐 이겨냈다. 이후 방방곡곡으로 좋아하는 새를 보러 다녔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애 씨와 1남 1녀(종민, 정림), 며느리 김영지 씨, 사위 김필관 씨가 있다. 빈소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은 17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별그리다’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美, 마두로 체포 후 첫 베네수 원유 판매…5억 달러 규모
-
5
40억 아파트, 방 한 칸 月140만원…집주인과 ‘동거 월세’ 등장
-
6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9
네이버·NC, ‘국가대표 AI’ 선발전 1차 탈락
-
10
통풍엔 맥주가 치명적?…여성은 맞고 남성은 아니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5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6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7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8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9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트렌드뉴스
-
1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美, 마두로 체포 후 첫 베네수 원유 판매…5억 달러 규모
-
5
40억 아파트, 방 한 칸 月140만원…집주인과 ‘동거 월세’ 등장
-
6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9
네이버·NC, ‘국가대표 AI’ 선발전 1차 탈락
-
10
통풍엔 맥주가 치명적?…여성은 맞고 남성은 아니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5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6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7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8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9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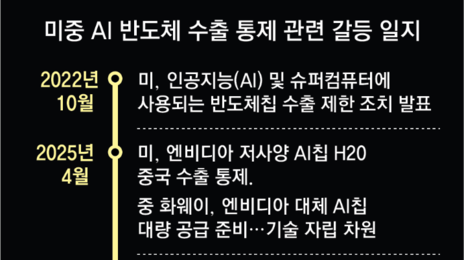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