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아파트의 까치밥, 아니 참새밥[소소칼럼]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뜯는 참새 떼를 보았다.
낡은 아파트 상가 건물 옆에 널려있던 초록색 비닐봉지들이 무언가 움찔거리는 낌새가 느껴졌다. 발걸음을 멈추자마자 작고 잽싼 것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참새들이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도시의 참새들이란 본래 작은 덤불 속에 알알이 열매처럼 맺혀 사춘기 소녀들처럼 지저귀거나, 감전 걱정도 모른 채 전깃줄에 옹기종기 매달려 짹짹대는 존재 아니던가. 그런데 고양이도 아니고, 참새와 쓰레기 봉지라니, 아마도 잘못 보았겠지.
낮 기온이 간신히 영상에 머물던 겨울날이었다.

봉지를 뜯던 참새의 잔상이 뇌리에서 쉽게 가시지 않던 저녁이었다.
인스타그램 화면을 훑어내리던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안에는 역시 참새가 있었다. 주홍빛으로 탐스럽게 익은 홍시 하나에 고개를 파묻고 정신없이 쪼는 세 마리. 달콤한 오찬을 즐기는 녀석들 뒤에는 역시나 밋밋하기 그지없는 무채색 아파트 건물이 있었다.
작은 새라고 가엾이 여길 게 아니라고, 가혹해 보일지언정 동물을 사람 손에 의존하게 만들면 악순환일 뿐이라고 난 생각해 보았다. 약육강식에서 밀려난 동물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라고도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섭리를 운운하다가도 자꾸만, 생각은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섭리를 따르지 않는 종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근엄한 자연의 섭리와 미안한 인간의 마음을 절반씩만 섞어보기로 했다.
때가 되면 높은 곳부터 익어가는 감을 “높아서 따기 힘들다”며 집집마다 몇 알씩 남겨두는 까치밥, 아니 참새밥을 흉내 냈다. 냉장고에서 며칠을 잠들어 반쯤 말랑해진 단감 한 알과 물그릇을 베란다 난간에 매달았다. 언제나 사람들 곁에 사는 새 치고는 너무나 겁이 많고 작은 존재들이 배불리 먹진 못하더라도 목은 축이고 입가심이라도 할 수 있길 기원했다.

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진 못하더라도, 그것의 춥고 고된 하루를 한 겹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한 생명으로서 할 일을 한 셈이라면 좋겠다. 겁 많은 참새들이 인간의 창가에 날아앉아 안도하는 찰나를 보내길 기다리며, 나는 그런 욕심을 내보았다.
이 정도 은근한 마음은 대자연도 이웃의 인간들도 눈감아주지 않을까.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
소소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용기를 줘 아자핑 [소소칼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0/13098012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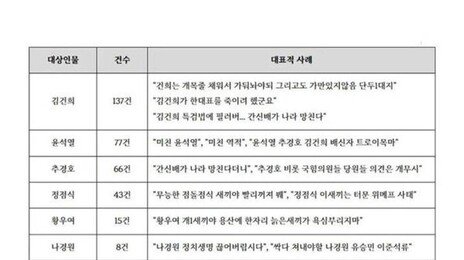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