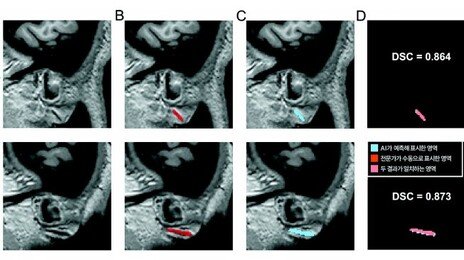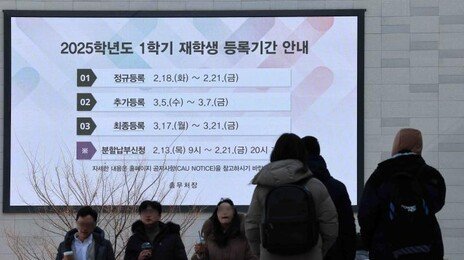인류는 언제부터 기념품을 사모았나… 과거엔 ‘부와 특권의 상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10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념품 / 롤프 포츠 지음·송예슬 옮김 / 200쪽·1만5000원 / 복복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념품을 사오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책에 따르면 기원전 2200년에도 기념품이 존재했다. 이집트의 하르쿠프 왕자는 수단으로 여행을 갔다가 파라오에게 바칠 선물을 수집했다. 왕자가 모은 표범 가죽, 코끼리 상아, 흑단 등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여행 기념품’ 중 하나로 꼽힌다.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품을 사모은 인류의 역사와 그 의미를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세계 70여개 국을 다녔고, 여행기를 쓰는 작가다.
영어로 기념품을 뜻하는 ‘souvenir’는 프랑스에선 흔히 동사로 쓰인다고 한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다. 저자는 자신이 살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두고 “그 자체로 무작위적인 박물관을 이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이해하는 방식을 전시한다”며 “기억과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일깨워주는 물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엔 여행의 기념품이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저자는 미국 사회학자 딘 맥커넬의 책 ‘관광객: 신유한계급론’을 인용해 기념품이 대중화한 과정을 짚는다. “한때 기념품이 장거리 여행을 가능케 하는 부와 특권의 상징이었다면, 철도와 증기선이 발달한 후로는 중산층 대중의 감성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기념품의 용도와 목적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짚는 대목도 흥미롭다. 예컨대 미 뉴욕에 있는 국립 9·11테러 사건 추모관은 기념품 매장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냉장고 자석이나 우산 등을 판매하는 게 유가족에게 충격을 줬던 탓이다.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부대가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물건이나 이라크의 역사나 종교와 관련 깊은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일 등은 ‘기념’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