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9일 23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3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생애 말기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원하는 방식의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 노인의 68%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사망자의 77%가 병원에서 죽는다. 노인의 84%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반대하는데 사망자의 60%는 연명의료를 받다 가는 실정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영국 대만 일본 등 6개 ‘웰다잉(품위 있는 죽음)’ 선진국의 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의 목표는 개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우선 살던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의 ‘죽음의 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은 호스피스 원조국답게 연간 31만 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입원형 시설 이용률은 18%에 불과하고 55%가 재택형, 나머지 27%는 집에서 지내다 주 1회 병원 다니듯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싱가포르 노인의 97%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덴마크는 71세 이상 노인 55%가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다.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공통점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죽음의 질 1위로 평가받는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연명의료 거부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한국은 사망 직전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지만 대만은 중증 치매, 말기 환자,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인 경우도 연명의료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사망자 20명 중 1명이 엄정한 심사와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20/13222405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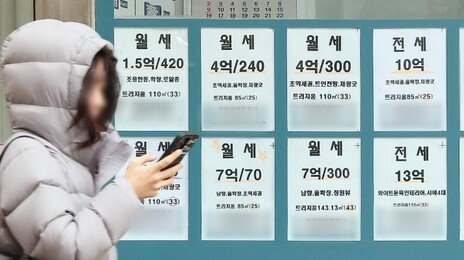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