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임금체계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청년들은 어쩌라고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같은 완충장치 없이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방식은 숱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년 연장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현행법에서도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앴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현행 구조에서 정년만 강제로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근로자는 8만 명 증가한 반면 23∼27세 근로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채용은 1.5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미래 세대의 좌절감을 더 키우고, 혜택도 대기업과 정규직 등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03/13251989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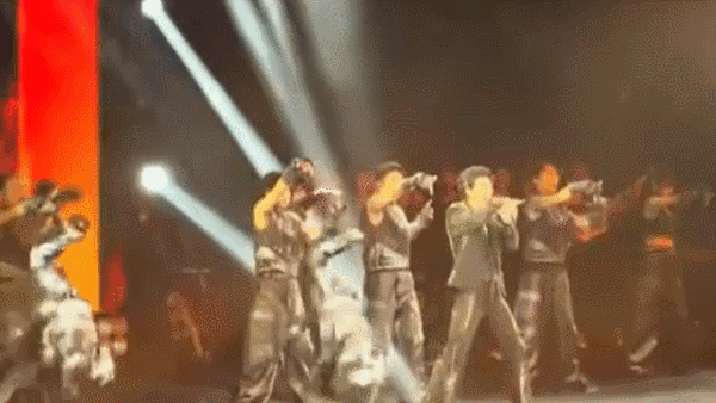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