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23시 3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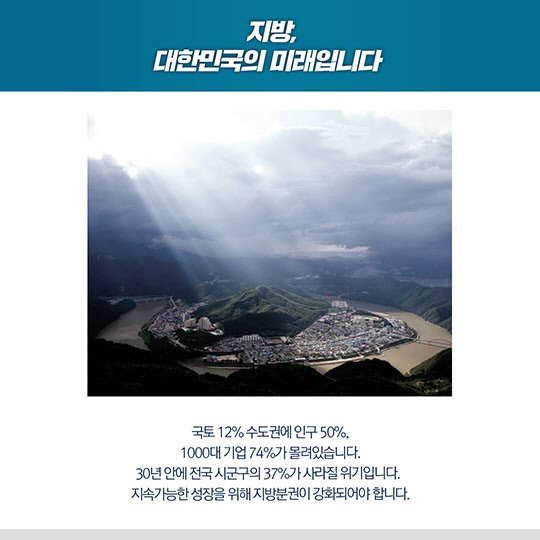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보다 오히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고 있다. 전체 지자체 243곳 중 104곳은 기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이런 지역에선 보조금이 삭감되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해야 할 처지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심의하고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할 일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묶여 제 역할을 못 할 때가 많다. 일부 지역에선 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인 단체장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단순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런 이유로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탓이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 때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는 내용을 헌법 1조에 추가해 지방분권을 국가 조직의 원리로 명문화했다. 지방이 자율성과 활력을 갖춰야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는 밀착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경험에서다. 중앙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과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막을 수 없다. 지방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자체의 예산과 입법에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진짜 분권에 다가설 때가 됐다.
트렌드뉴스
-
1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8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9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0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7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트렌드뉴스
-
1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8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9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0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7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0/13319838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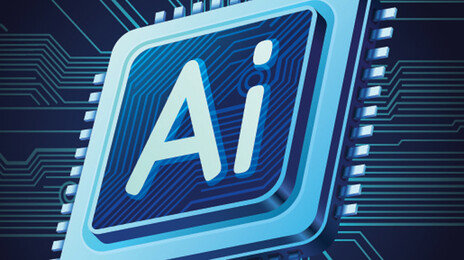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