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용]‘대출 부자’만 양산한 관치 부동산의 실패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6·3 대선이 끝난 뒤 서울 중구 한 아파트단지에 큰 평수보다 더 비싼 20평대 매물이 등장했다. 시세보다 2억 원 높게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갑자기 1억 원을 더 올려 호가가 뒤집힌 것이다. 단지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이 집주인인데 팔 생각이 없고 가격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대선 전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는데 한 달 만에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었다. 정부가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6·27 대출 규제를 꺼낸 건 부동산 불장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의 부동산 중독, 서울 불장 키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연 소득의 10.1배로 전국 평균(3.9배)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은 몇억 원씩 호가를 턱턱 올린다. 은행 대출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한 주택 대출을 선호한다. 은행 자본 규제도 주택 대출이 기업 대출보다 위험 가중치가 낮다. 금융의 수도꼭지가 산업 부문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잘못 설계된 것이다.
국토부 등은 정책대출이 9억 원 이하 주택만 지원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호텔경제론’으로도 간단히 반박할 수 있는 어설픈 해명이다. 예를 들어 김모 씨가 정책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김 씨에게 집을 판 이모 씨는 이 돈에 은행 대출을 얹어 서울에 입성하고, 이 씨에게 집을 판 박모 씨는 대출을 더 얹어 서울 강남에 입성하는 식의 돈의 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는 빚으로 만들어진 집과 이를 보유한 ‘대출 부자’가 급증했다.
국토부가 뿌린 주택 정책대출은 심지어 무주택자 등이 낮은 이자를 무릅쓰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간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쓰여야 할 이 돈이 정책대출과 전세보증 정책금융에 동원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버팀목으로 변질됐다. 주택 공급 우려는 여전한데 정책금융에 돈이 흘러 들어가 여윳돈이 고갈되고 있다. 대출 부자를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가 희생하는 기울어진 금융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집은 성실하게 모은 돈이 아니라 급전이라도 당겨서 당장 사야 하는 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을 잠재우지 못한다. 투기 심리가 불붙으면 주택을 식빵처럼 찍어낸다고 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관치 부동산 실패부터 바로잡아야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주의 PICK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9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10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9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트렌드뉴스
-
1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9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10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9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이세형]트럼프 남은 임기 3년이 더 긴장되는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0/133198359.1.jpg)
![트럼프 남은 임기 3년이 더 긴장되는 이유[오늘과 내일/이세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98359.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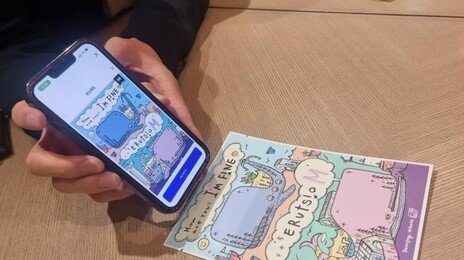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