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진짜’ 의료개혁 위한 10개년 계획 짜야[기고/윤영호]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의대 증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련받던 전공의 60%가 재취업했고,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10%만 참여해 미래 국민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 양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는 지역 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폭풍전야처럼 조용하지만, 의정 갈등이 재발하지 않을까 두렵다.
전공의 수련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높은 수준을 책임져 왔으며, 창의적 의학 연구와 바이오헬스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학병원의 기능이 붕괴할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은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가 피해자다.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10개년 개혁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명분과 함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이다.
첫째, 의료개혁 10개년 계획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로드맵과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공약에 있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 의사,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진짜’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 국민도 의료개혁에 참여하되 건강도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 민주화’가 필요하다.
셋째, 빈약한 공공·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기관의 5%, 병상 9%, 의사 10%만이 공공의료에 속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 시설과 주요 장비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자. 첨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넷째,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수가를 통제해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접근성과 우수한 수준의 의료는 더 불가능하다. 필수의료의 적정 수가를 보장해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전공의 교육, 첨단 연구, 보건정책의 근거 창출 기반이 되게 하자.
끝으로,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은 환자의 자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의사의 생산성을 향상해 의사 인력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의료의 지속가능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년 전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성과를 냈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8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9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0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7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트렌드뉴스
-
1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사망
-
8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9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10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7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장동혁 만난 이준석 “양당 공존, 대표님이 지휘관 역할 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지역 대학, 노력하면 길은 열린다[기고/박민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0/13319824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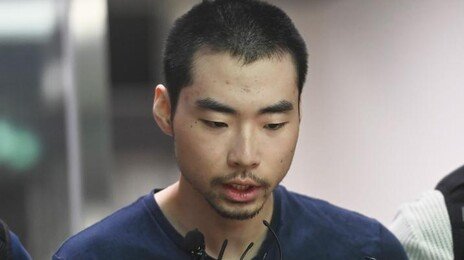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