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수교 60년, 서로에게서 배우는 한일관계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여름까지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다 귀국한 이나다 기요히데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 최근 책 한 권을 보내왔다. 제목은 ‘축소하는 한국, 고뇌의 향방(아사히신서)’. 한국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이민,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인구 문제를 다룬 문고판이다. 띠지에는 ‘한국 현실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거나 ‘출산율 0.72의 현실’, ‘인구 절반이 수도권 집중, 지방은 쇠퇴’, ‘그러나 한국인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 등의 문구가 장식돼 있다. 지난해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기획 시리즈를 첨삭 보완해 250여 쪽 분량의 책으로 엮었다는 설명이었다. 취재에 이나다 위원을 비롯해 기자 5명이, 편집에 국제보도부 데스크 등 3명이 참가한 역작이다.
일본에서도 한국 인구 문제에 지대한 관심
책장을 넘기며 격세지감이 들었다. 기자는 인구구조에 관한 한 한국이 일본서 일방적으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 왔고, 실제로 그런 기사를 ‘100세 카페’ 칼럼에 열심히 써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한국보다 1970년대 기준으로는 30년, 2000년대 기준으로는 20년 앞선다. 예컨대 고령자가 인구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일본은 2005년, 한국은 지난해 말 돌입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이후로도 심화돼 2023년 기준 29.3%에 이른다. 대개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원인을 따져 본 뒤 ‘그런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다, 대책 없이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식의 기사를 써왔다.
각자도생 트럼프 라운드에 공조하는 실용외교
인구 문제 외에도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고민거리는 많다. 특히 미중 갈등과 트럼프 라운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협력 여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기자는 도쿄에서 일했는데, 동맹국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같은 처지인 한국과 일본이 상의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다. 현실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만의 국익을 위해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뛰어다녔고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불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듯하다. 그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던 일본인들의 경계심은 이재명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을 확인하며 누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을 가져 일본인들의 의구심을 풀어줬다. 그 일주일 뒤로 예정됐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을 참고해 이시바 총리도 불참하기도 했다. 서로를 살피며 보조를 맞추는 간접적인 한일 공조를 보는 것 같았다.
내일은 광복절 80주년이고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 되는 해다. 각자도생이 강조되는 국제 환경이지만, 국익에 입각하되 서로를 살피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양국 관계를 좀 더 성숙하게 이끌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
구독
-

지금, 이 사람
구독
-

기고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유재동]소주성 냄새 풍기는 ‘진짜 성장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14/13219147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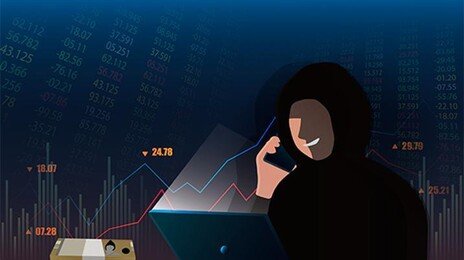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