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公기관 너무 많아 숫자도 못 세”…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과거 정부들은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몸집을 불려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331개로, 전체 정원은 42만3000명에 이른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298곳, 임직원 24만9000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는 정부·정치권의 필요와, 조직을 키우려는 노조 등 기득권의 요구가 일치하며 유사·중복된 기관이 우후죽순 늘었다.
방만 경영이 계속되며 구조조정은 뒷전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741조5000억 원으로, 지난 정부 3년 동안 157조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공공기관의 빚은 국가채무로 잡히진 않지만 구멍이 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숨겨진 나랏빚’이다.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공공이 떠안으면서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15/1321957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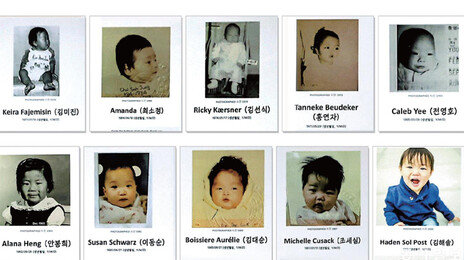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