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심벌즈까지?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가 함께하는 이유[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클래식 공연장에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른다. 무대 위를 바라보면 가장 앞줄에는 줄줄이 늘어선 현악기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반짝이는 은빛의 목관악기들이 배치돼 있다. 더 뒤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금관악기들, 맨 뒤편에는 커다란 팀파니와 심벌즈 같은 타악기들이 무대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수십 명, 때로는 100명이 넘는 연주자가 한 무대에 모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미술가들은 미술작품을 완성할 때 다양한 색깔을 쓴다. 파란색 하나만으로는 바다도 하늘도, 심지어 청바지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늘은 파란색뿐 아니라 흰색, 회색, 은색 혹은 연한 청색이 뒤섞여야 한다. 바닷물도 깊은 남색, 맑은 청록색, 에메랄드 등 여러 색깔이 필요하다. 단일한 색으로는 세상의 다채로움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향수의 세계도 그렇다. 향수는 단순히 한 가지 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처음 맡았을 때 코끝을 스치며 가장 먼저 퍼지는 향이 톱노트다. 시트러스나 허브처럼 가볍고 상쾌한 향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 향은 금세 사라진다. 톱노트가 잦아들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향이 미들노트다. 플로럴 계열이나 부드러운 스파이스 계열처럼 향수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심적인 향기가 여기에 머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도록 잔향을 남기는 것이 베이스노트다. 우디나 머스크 같은 깊고 묵직한 향들이 주로 베이스를 담당한다. 향수는 이 세 가지 층위가 서로 겹치며 하나의 완성된 향기를 만들어 낸다.
오케스트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플루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향수의 톱노트처럼 음악을 날렵하고 가볍게 만든다. 클라리넷이나 비올라 같은 중간 음역대의 악기들은 미들노트처럼 전체 음악의 분위기를 결정하며 중심을 잡아준다. 마지막으로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같은 악기들은 베이스노트처럼 오래 남는 깊은 울림을 준다. 향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향을 겹쳐내듯, 오케스트라도 서로 다른 악기가 겹치고 어우러지며 음악을 입체적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듣는 경험은 마치 하나의 향수를 맡는 것과 같다. 톱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서로 겹치며 깊은 향기를 엮어 내듯 서로 다른 악기들의 음색이 겹치고 어우러질 때 음악은 비로소 입체적인 울림을 완성한다.
물론 악기가 다양하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향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이면 향수가 탁해지듯 수많은 악기가 제멋대로 소리를 내면 음악은 쉽게 산만해진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지휘자다. 지휘자는 각 악기가 자기 색과 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울림으로 어우러지도록 음악을 이끈다. 마치 조향사가 수많은 원료의 향을 섬세하게 조율해 하나의 향수를 완성하듯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라는 거대한 향의 층위를 조율하는 것이다.
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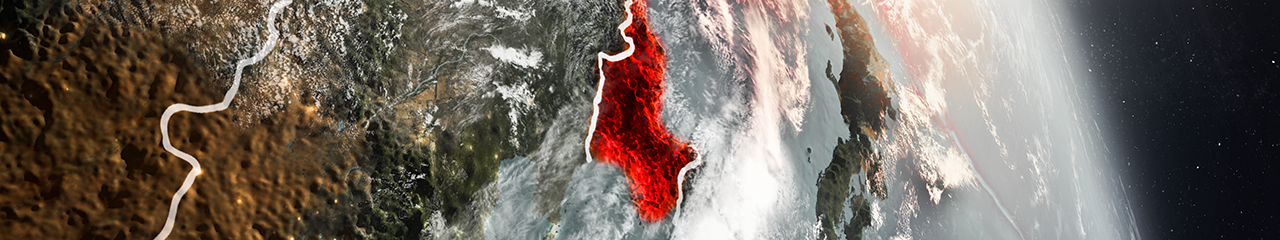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구독
-

사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반복되는 선율, 음악을 기억에 새기다[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5/132391679.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