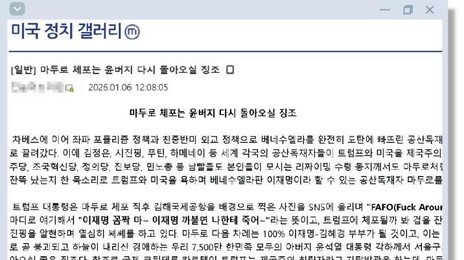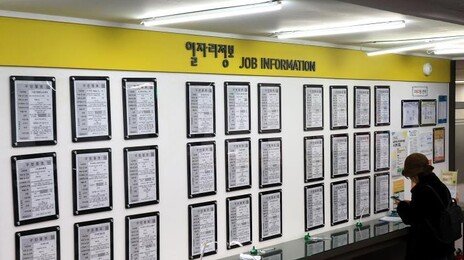공유하기
‘경제패권’ 책임졌던 청어와 조기[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34〉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청어는 유럽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물고기다. 청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쉽게 부패해 식량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금이 귀했던 중세시대에는 염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청어의 유통기한은 2주 정도로 짧았다. 덴마크 왕국의 스코네 어장이 부상하던 시기에 새로운 염장법이 나타났다. 내장을 제거한 청어를 나무통에 채우면서 사이사이에 소금을 덮은 것이다. 소금에 수분이 빠진 청어를 다시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었다. 새 보존 방식이 알려지면서 장거리 교역이 가능해진 청어는 국제적인 무역상품으로 떠올랐다.
14세기 절정기였던 발트해의 스코네 어장과 어시장은 매년 8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렸다. 청어잡이에 나선 선원이 1만7000명을 넘었고, 청어 거래 관련 업무에 나선 사람은 8000여 명에 달했다. 상품화된 청어의 포장재에는 원산지, 포장 시간, 내용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를 찍었다. 하자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상인 표식도 했다. 정교한 가공, 유통 시스템으로 스코네산 청어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또한 발트해 연안 도시들의 무역동맹인 ‘한자동맹(Hanseatic League)’이 결성돼 교역로를 독점해 북유럽의 경제 패권을 장악했다.
15세기 초 청어의 회유 경로가 발트해에서 북해로 옮겨가면서 네덜란드가 신흥강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발트해에서 청어가 사라지면서 한자동맹은 쇠퇴했다. 네덜란드는 청어잡이 전용 선박을 개발해 최소의 선원으로 장시간 바다에 머물며 선상에서 생선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했다. 1600년에는 청어잡이 어선이 800척에 이르렀고, 청어를 잡는 어부가 6000∼1만 명에 달했다.
조기는 곧 돈이었고, 파시가 열리는 섬은 돈이 넘쳤다. ‘연평도 어업조합 일일출납고가 한국은행 일일출납고보다 많았다’ ‘연평도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황해도 도지사 안 한다’라는 구절은 당시 연평도의 위상을 보여준다. 영원할 것 같던 연평어장의 활황은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고, 흑산도 파시도 1980년대에 사라졌다. 조기와 돈과 사람이 넘치던 시절은 이제 몇몇 노인의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조기 파시의 황금시대를 증명하던 연평도 어업조합 건물은 10여 년 전 헐리고 그 자리에 수협 건물이 신축됐다. 우리 근현대 어업사를 비추는 역사적인 건물이 사라진 것이다. 다행히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다큐 영화 ‘흑산도 파시’를 제작해 8월 15일에 제1회 흑산섬영화제(HIFF) 개막작으로 상영했다고 한다. 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파시의 자취를 찾아내 영상으로 복원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패션 NOW
구독
-

사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 굿즈로 탄생[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3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6/1324027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