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이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 그간 검찰의 항소 관행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항소로 피고인들이 과도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미국에선 헌법상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검사 항소가 법적으로 제한될 경우 실체 규명 기회가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의 항소권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 기준)에 따르면 1심 무죄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바뀐 비율은 15.2%이고, 2심 무죄가 3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건 4.4%에 불과하다. 검찰에선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 면피용으로라도 항소하고 보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다.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을 땐 혐의 입증이 충분했는지 돌아보기보단 구형 대비 선고형의 비율만 따져 기준에 미달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일이 빈번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검사의 항소를 허용한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독일 검찰은 법률적 오류를 따질 때만, 일본 검찰은 1심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항소한다. 2023년 일본 1심 판결 항소 사건 중 검찰이 항소한 건 1.2%에 불과했고, 이들 사건 약 70%에서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항소권의 적절한 행사는 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입법 논의에 앞서 검찰이 신중하게 항소·상고를 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EU도 철강 관세 50%… 여야 ‘1호 합의’ K스틸법은 어디서 잠자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08/13252749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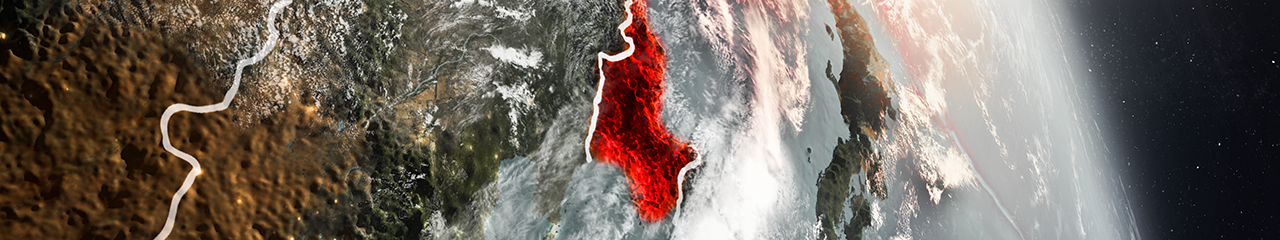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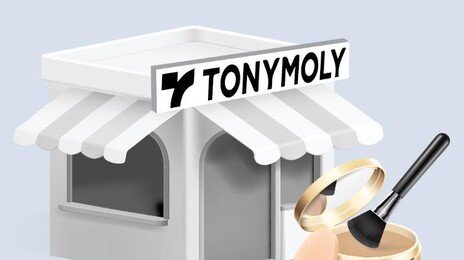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