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무욕의 다짐[이준식의 한시 한 수]〈344〉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이 계절의 풍광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만, 가을날의 감회는 왜 이리 쓸쓸한지.
서풍에 펄럭이는 저잣거리 주막의 깃발, 가랑비 내리는 하늘 아래 만개한 국화.
세상사 걱정에 하얘진 귀밑머리가 서럽고, 녹봉만 잔뜩 챙기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네.
(節物豈不好, 秋懷何黯然. 西風酒旗市, 細雨菊花天.
感事悲雙鬢, 包羞食萬錢. 鹿車何日駕, 歸去潁東田.)
―‘가을의 감회(추회·秋懷)’ 구양수(歐陽脩·1007∼1072)
당시 시인은 아직 마흔도 안 된 나이. 이 시는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려는 체념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되뇌는 고뇌의 노래로 읽힌다. ‘사슴 수레’란 사슴 한 마리를 실을 만큼 자그마한 수레를 말한다. 언젠가 야인이 되면 간소한 행장을 차리고 떠나겠다는 무욕의 다짐이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노랫가락의 울림[이준식의 한시 한 수]〈34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2/04/13290567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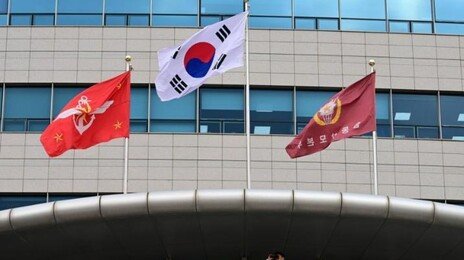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