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전 164기… 끈기있게 도전하다보면 언젠가 이뤄, 나를 봐!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무관의 제왕’ 플리트우드 PGA 첫승
PGA 준우승만 6회 정상급 골퍼… 투어 챔피언십서 우승 ‘무관’ 탈출
“내 스토리는 끈기와 노력 이야기… 우승 여부 떠나 살아온 길 자부심”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기쁘다.”
토미 플리트우드(34·잉글랜드)는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PO)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뒤 이렇게 말했다.
플리트우드는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패트릭 캔틀레이(33·미국), 러셀 헨리(36·미국·이상 15언더파 265타) 등 공동 2위 그룹을 3타 차로 따돌렸다. 30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투어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투어 우승을 따낸 플리트우드는 1000만 달러(약 139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플리트우드는 이번 대회 전에도 이미 세계적인 골퍼였다. DP월드투어(옛 유럽투어)에서 7차례 정상을 차지했고, PGA투어에 진출해서도 163번 출전해 톱5에 30회, 톱10에는 44회나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건 그는 세계랭킹 10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PGA투어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준우승만 6차례 한 그에게는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따라 다녔다.
플리트우드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내 스토리는 끈기와 노력의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패배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계속 노력했다. 다시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샷을 연마했다”며 “매번 기회를 놓치거나, 다른 선수에게 졌을 때도 늘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해 왔다. 오늘은 그런 노력이 통했다”고 말했다.
보통 선수라면 제풀에 무너질 법도 했다. 하지만 ‘긍정의 아이콘’인 플리트우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대회장으로 나와 최선의 플레이를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164번째 PGA투어 출전 대회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플리트우드는 “사람마다 영감을 주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 이야기는 정상에 서기 위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한 이야기”라며 “스포츠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어려운 패배 후에도 다시 두드리고 도전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동료인 셰인 로리(38·아일랜드)는 “플리트우드는 여러 차례 넘어졌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2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3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4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5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6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7
[단독]㈜한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과 ‘테크·라이프’로 인적 분할
-
8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5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
9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부추긴 혐의
-
10
李 “한일 협력 어떤것보다 중요” 다카이치 “양국, 한층 높은 차원으로”
트렌드뉴스
-
1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2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3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4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5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6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7
[단독]㈜한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과 ‘테크·라이프’로 인적 분할
-
8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5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
9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부추긴 혐의
-
10
李 “한일 협력 어떤것보다 중요” 다카이치 “양국, 한층 높은 차원으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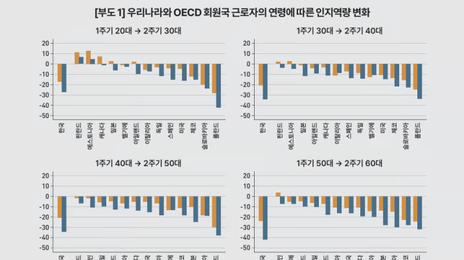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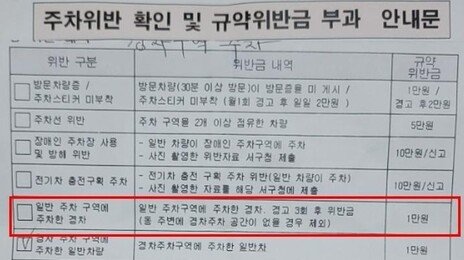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