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과학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기고/김광용]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년을 보내던 중,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수만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와 연구시설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진심 어린 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는 과연 과학기술을 이들만큼 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됐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 과학기술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듯하다. 겉으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적 기반과 인식의 깊이는 여전히 아쉽다.
1660년에 설립된 영국왕립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아카데미 중 하나로, 단순한 학문 공동체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곳의 회원 자격인 FRS는 최고의 과학적 영예로 여겨진다.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은 노벨상 중 물리학상, 화학상 및 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권위를 지닌다. 미국의 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과학 자문을 수행하며, 매년 수백 건의 보고서를 통해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 기술 정책 자문, 국제 교류, 과학 문화 확산, 청소년 교육, 과학기술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림원의 존재를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집단 지성인 한림원을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최된 ‘국경 없는 과학기술 인재 전쟁’ 국회 포럼에서는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반면, 국내 유입은 저조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자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도 중요하다. 과학기술인의 헌신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알쓸톡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3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7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8
취업 1년 늦춰진 ‘장백청’ 임금 7% 감소…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
9
의협 ‘의대증원 350명’ 2년전 협상안 다시 꺼낼 듯
-
10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1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2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10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3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7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8
취업 1년 늦춰진 ‘장백청’ 임금 7% 감소…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
9
의협 ‘의대증원 350명’ 2년전 협상안 다시 꺼낼 듯
-
10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1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2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10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절개 없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유로리프트’, 일상 복귀 빠른 신개념 시술로 주목[기고/이무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6/1331707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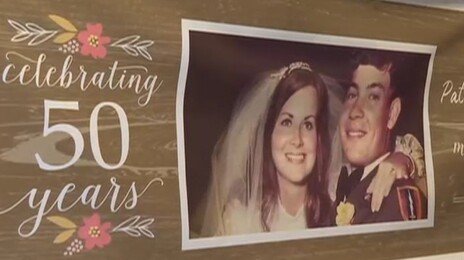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