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댐 정책…1년 만에 또 바뀌었다
- 뉴시스(신문)
글자크기 설정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기후위기 대응하기에는 규모 작아”
댐 정책, 정권마다 방향 크게 수정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됐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한 7개 댐들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대응한다’는 명분과 맞지 않게, 댐들 규모가 작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14개 댐의 저수용량은 총 3억2000만t으로, 소양강댐(29억t)의 약 11%에 그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 댐 필요성을 홍보했었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의 댐들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댐은 용도에 따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기존 댐들의 활용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한수원의 양수발전댐이나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었는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양수발전댐을 이용하면 사업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약 2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문천댐 역시, 하천 정비를 완료하고 기존 운문댐의 수위를 복원하면 새 댐을 짓지 않고도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댐 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사실상 일방적인 추진이었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댐 신설을 요구한 경우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동복천댐의 경우 전라남도는 건설을 원했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동복천 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추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내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댐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되면서, 필요성과는 별개로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댐 정책은 정권마다 방향이 크게 바뀌어왔다.
예를 들어 수자원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12년 국토부가 세운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신규 댐 건설만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며 더 이상 국가 주도로 댐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는 5년 만에 입장을 바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내놨고, 올해 후보지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도 진행해왔다.
당시에도 댐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환경부는 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계획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철회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가 입장을 번복하며 댐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댐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다만 지방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까지 묶어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댐 하나하나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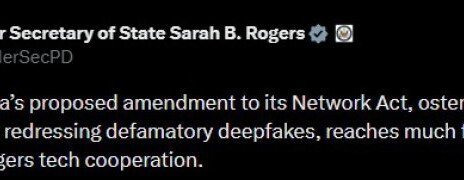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