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굴스키’ 간판서 변호사 된 서정화 “운동이 ‘ON’이라면 공부는 ‘OFF’”[이헌재의 인생홈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4일 12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국내에서 모굴스키 대회가 열렸다. 당시 그는 정식 선수는 아니었지만 전(前) 주자로 먼저 코스를 탔다. 일본 주니어 대표팀을 이끌고 방한했던 일본 감독이 그 모습을 지켜본 뒤 “같이 일본으로 가서 훈련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그는 ‘정식’ 모굴스키 선수가 됐다.
일본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그는 고1 때 한국 모굴스키 국가대표가 됐다. 하지만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단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간고사를 보러 가기 위해 하루 훈련에서 제외해 줄 것을 대표팀에 요청하자 코칭스태프는 국가대표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는 과감히 태극마크를 포기하고 시험을 보러 갔다.

모굴스키를 선택한 것도, 시험을 보기 위해 국가대표를 포기한 것도 남달랐던 그는 전 한국 여자 모굴스키 국가대표 서정화(35)다. 그때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는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강원 춘천에서 만난 서정화는 “어린 마음에 ‘국가대표가 안 되면 체육 선생님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당시에도 꿈은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도, 나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년 뒤 그는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엔 대표팀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걸 허락해줬다. 고교 졸업 후 대학은 운동과 학업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미국으로 갔다. 서던캘리포니아대에 입학한 그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전공하면서 스키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는 두 차례 겨울올림픽에 출전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선 21위를 했고, 2014년 소치 대회 땐 부상 여파로 24위를 했다. 서정화는 “미국에서는 운동 선수를 대하는 문화가 한국과는 천양지차였다.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얘기하면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운동도 잘하는구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라며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말처럼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스키 종목 특성상 주요 국제대회는 유럽 등에서 많이 열렸고, 올림픽 등을 앞두고는 훈련도 유럽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정화는 “전지훈련을 가거나 대회를 갈 때에는 에세이 등을 과제로 대신 제출해야 했다. 계절학기도 들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에만 매몰되지 않아 좋았다. 사람은 누구나 온-오프(on-off)가 있어야 하는데 내 경우엔 ‘온’이 운동이었다면 공부가 ‘오프’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래도 일반 학생들보다 졸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9년 입학한 그는 2015년에 졸업장을 받았다.

여기서 의문 하나. 딱딱한 얼음 같은 슬로프에 잘못 착지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평소 모굴스키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걸까.
서정화는 “처음에는 공중 동작을 지상에서 익힌다. 트램폴린 등을 이용해 체조처럼 동작을 한다”라며 “이게 익숙해지면 ‘워터 점프’라고 해서 물에 착지하는 동작을 익힌다. 물에 착지하는 것까지 몸에 완전히 익히면 눈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선수로 뛸 당시 국내에는 ‘워터 점프’ 시설이 없었다.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전지훈련을 가야 했다.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 그는 ‘제2의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다행히 학창 시절 내내 공부와의 끈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변호사 시험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
운동과 학업의 병행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의 운동 시간이 너무 길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두세 시간 하는데 우리는 7, 8시간을 한다”라며 “긴 운동 시간에는 부상 위험도 따른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우리 선수들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 공부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선수들의 인생에도 운동 이외의 삶이 있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학교를 다니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향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경우엔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로스쿨을 선택한 계기가 됐다. 서정화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일하고 있는 로펌에서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든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무와 별개로 그는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선수위원을 맡으며 시민단체인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정화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협회나 지도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 선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인권 침해의 원인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는 운동을 시작한 후 거의 떨어져 지냈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선수 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운동도 꾸준히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러닝과 근육 운동을 한다. 최근에는 클라이밍에도 재미를 붙였다. 서정화는 “스키 선수 생활을 할 때는 하체를 많이 썼다. 그래서 당시 ‘크로스 트레이닝’을 위해 비시즌에는 상체 위주의 클라이밍을 했었다”라며 “당시엔 운동을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재미로 한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고향은 스키 슬로프다. 은퇴 후에도 가끔 스키장에서 눈 위를 달렸던 그는 지난해부터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모굴 종목에 출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출전한 작년과 올해 모두 그는 일반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정화는 “대회 때가 아니면 완벽한 모굴스키 코스를 타 보기가 어렵지 않나. 오랜만에 대회 코스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라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헌재의 인생홈런]‘천하장사’ 이태현 “날 다시 받아준 모래판은 내 운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01/13229921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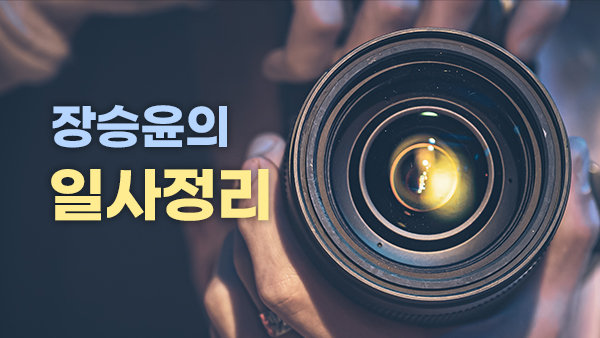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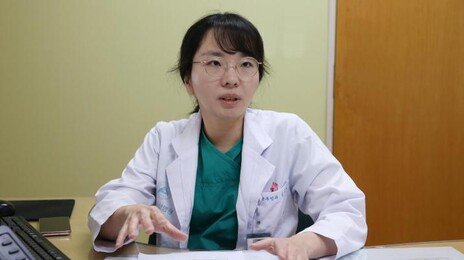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