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향 집에 살어리랏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한시를 영화로 읊다] 〈114〉 도연명의 이사
박제범 감독의 ‘집 이야기’(2019년)에서 혼자 서울살이 하는 주인공 은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몇 번째 집이냐는 부동산 중개사의 질문에 은서는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이사라고 답한다. 정주(定住)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처럼 옛사람들도 안정된 집을 찾아 이사를 다니곤 했다. 도연명도 이곳저곳 옮겨 살았다고 하는데, ‘이사’를 주제로 한 다음 시에 그 사연이 담겨 있다.
시인이 굳이 교외의 남촌(남쪽 마을)으로 이주한 것은 이곳이 누구나 바라는 좋은 거주지여서가 아니었다. 비록 집은 볼품없지만 마음 맞고 대화가 통하는 이웃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이의현(李宜顯, 1669~1745)에게 도연명이 누린 남촌에서의 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세파에 시달리느라 그런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한탄했다(‘雲陽漫錄’). 우리에겐 각자 꿈꾸는 집이 있다. 도연명의 이사가 보여주듯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좋은 입지와 고대광실이어서가 아니라 즐거운 소통이 가능한 정신의 안식처기 때문이다.
한시를 영화로 읊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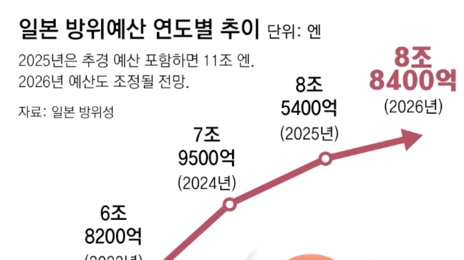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