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소화제, 수면제, 항우울제가 필요할 땐… 조명 대신 햇빛 쬐세요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간, 빛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
아침에 햇빛 쬐면 코르티솔 분비… 저녁엔 멜라토닌 나와 수면 도와
생체리듬 망가지면 건강 ‘적신호’… 야간 근무, 발암 요인 지정되기도
◇광합성 인간/린 피플스 지음·김초원 옮김/496쪽·2만9000원·흐름출판


내부 조명마저 생체리듬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붉은빛으로 바꾸고, 시간을 짐작할 수 없는 지하 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낸다. 그 결과 저자는 수시로 아침과 저녁을 혼동했고, 몸의 리듬이 엉망이 되는 경험을 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자 위장과 기분, 수면의 균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얼핏 극단적 실험으로 보이지만 사실 많은 현대인의 일상이 이 실험과 흡사하다. 대부분이 창 없는 사무실에서 햇빛 없는 낮을 보내고, 밤에는 휴대전화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은 인간의 몸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적절한 빛을 받지 못하면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빛이 들지 않는 지하 벙커에서 지낸 저자의 체험담을 비롯해 과학자와 의사, 우주비행사 등 낮밤의 경계가 흐린 다양한 직군의 사례를 취재함으로써 인류가 태양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된 존재인지를 파헤친다.
이런 생활은 악순환을 낳는다. 생체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시간을 느리게 인식해 쉽게 잠들지 못한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생체리듬에 필수적인 햇빛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오늘날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일곱 시간 미만으로, 1940년대보다 약 1시간 줄었다.
수면 부족의 영향은 경제적으로 환산해도 치명적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한 해 불충분한 수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41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런 손실은 사회적 계층이나 빈부 격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이 백인보다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하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인 디트로이트와 버밍엄에선 성인의 약 50%가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교대 근무자들은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해 생체리듬이 파괴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입원 환자 가운데 교대 근무자는 주간 근로자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도 야간 근무를 잠재적 발암 요인으로 지정했다. 새벽배송 등으로 야간 근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주의 깊게 볼 만한 대목이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트렌디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책의 향기/밑줄 긋기]너를 보내는 동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09/133126039.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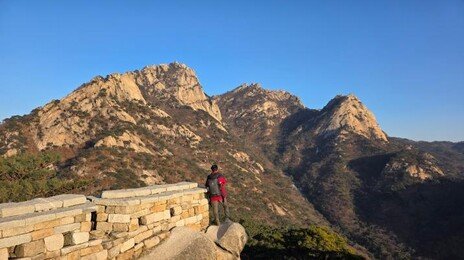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