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흥청망청’ 70조 교육교부금 그대로… 말로만 ‘지출 구조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23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써야 할 돈을 쓰면서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수조 원이 남아돌아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70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손을 대지 않아 ‘무늬만 구조조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재정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해 교육교부금 4100억 원을 줄였다고 했다. 하지만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근본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교육 수요에 관계없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자동으로 증가해 올해 기준 70조3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30만 명 이상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연 15조 원 가까이 늘어난 기이한 구조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나라 재정이 쪼들리는데도 전국 시도교육청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다 쓰지 못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금액만 연 5조∼8조 원에 달하고, 교육청이 쌓아 놓은 현금성 자산은 2023년 말 기준 18조7000억 원에 이른다. 돈이 남다 보니 멀쩡한 건물을 부숴 다시 짓거나 불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사들이고 학생들에게 공짜 노트북과 현금을 나눠주는 등의 심각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응, 등록금 동결로 재정 고사 상태인 대학 교육 지원 등 필요한 다른 분야로 전용해 쓸 수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향후 35년간 매년 2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02/1323077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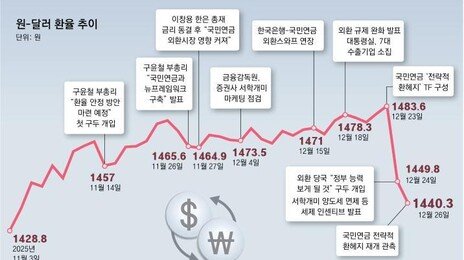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