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7%뿐…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8일 23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치매 진단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받은 운전자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평가를 받은 1235명의 치매 운전자 가운데 불합격한 사람은 58명(4.7%)에 불과했다. 나머지 1177명은 합격 또는 판정 유예를 받아 면허를 유지하거나 1년 후 재판정을 받을 때까지 운전대를 잡는 데 제약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상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도로교통공단으로 자동 통보돼 위원회 평가를 받는다. 연간 1만8000명가량이 평가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은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이 위원회 평가를 통해 면허를 유지한다.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만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져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불합격 판정 비율이 낮으니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치매 판정 후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점도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치매에 걸려도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교통공단에서는 알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도 2023년 치매 진단 후 3개월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이후로는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아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9/1324916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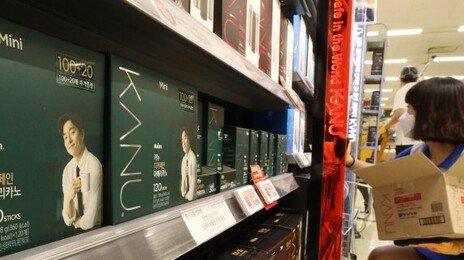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