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매력’으로 인구 절벽 넘는 도시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7일 23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때 취리히 제네바에 이은 스위스 제3의 금융 중심지였던 루가노는 스위스의 금융 비밀주의가 흔들리며 시들어 갔다. 활력을 되찾기 위해 루가노는 ‘비밀금고’에서 ‘가상자산’으로 도시의 색깔을 바꿨다. 도심 공원에 비트코인 창시자의 동상을 세울 정도로 가상자산에 진심이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시절부터 있었을 것 같은 노포에서도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세금도 코인으로 낸다. 최근 3년간 유치한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만 100여 개에 달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하던 노키아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침체에 빠졌던 핀란드 북부 도시 오울루는 이제 ‘노키아 도시’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다만 한때 노키아의 상징이던 혁신의 정신만은 그대로 남겼다. 통신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했다. 친환경 에너지 & 클린테크, 교육, 소비재, 헬스케어, 게임,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의 스타트업이 활동하며 시 전체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거듭났다.
▷호주의 산업도시 질롱은 ‘러스트벨트’에서 ‘실리콘밸리’로 변신했다. 자동차 공장이 속속 폐쇄되며 위기를 맞았던 질롱은 도시의 엔진을 자동차에서 장갑차, 자주포 등 방위산업으로 갈아 끼웠다. 과거 양모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의 강점을 이용해 탄소섬유 등 신소재 개발에 적극 나섰다.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말뫼도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몰락에 좌절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한 해외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인프라를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전통금융을 가상자산으로, 통신 연구개발(R&D)을 스타트업으로 바꿔내는 식이다. 남들이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베낀다고, 정착지원금을 뿌리거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구와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지역의 자산을 바탕으로 특화 전략을 찾아내고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지방 도시들이 해외 도시의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다.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DBR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박중현]AI 시대, 더 거세진 구조조정 칼바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28/13265612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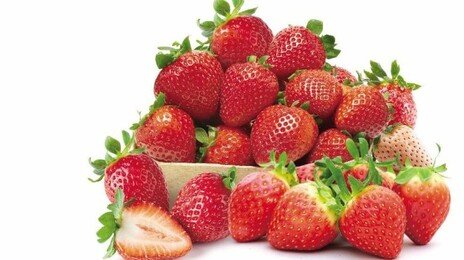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