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늘어났네?” 출생아 수 반등의 함정[기고/정재훈]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명(3.8%) 늘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 역시 2024년 9만9194명에서 2025년 10만6048명으로 6.9%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때 이른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출생아 수 증가는 내년이나 머지않아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4년과 올해 출산이 가장 많은 연령대, 이른바 ‘주 출산 연령대’는 30∼34세다. 1991∼1995년생으로, 1980년대생보다 출생 규모가 컸던 세대다. 1990년대생이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1980년대 연간 출생아 수는 1990년대보다 적었다. 이는 여아 낙태의 여파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84년 67만5000명에서 1987년 62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태아 성감별을 처벌하고 남아선호 사상이 약화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출생아 수가 다시 늘었다. 1990년 65만 명을 넘었고 1991년 약 71만 명, 1995년에는 71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96년부터는 7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그 뒤로는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주 출산 연령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즉 연간 7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여성들이 빠져나간다. 그 대신 1996년 이후, 70만 명 이하로 태어났던 세대가 주 출산 연령대로 들어온다. 내년부터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 추세는 멈출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증가는 희망적 신호라기보다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드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착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출산 기피 이유로 ‘비용 부담’을 꼽지만, 이는 단순한 기본 양육비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경쟁 구조가 부모에게 강요하는 ‘압박 비용’이다. 사교육비, 주거 환경, 체험 활동 등 막대한 비용이 부모의 삶을 옥죄고 있다. 부부가 아무리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출산 장려금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육 개혁과 사회 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압박 비용’이 사라지고 출산 의지도 생긴다.
출생아 수의 단기 증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개조라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상징되는 낡은 정치구조가 사라지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대응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담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랠리’ 끝난 비트코인… NYT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다”
-
2
‘똘똘한 한 채’ 열풍…자가 비율 1위 싱가포르도 못 막았다[딥다이브]
-
3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4
어제 산 깻잎 검은 반점 왜?…“이렇게 보관하세요” [알쓸톡]
-
5
7개월 아기 젖병 물려놓고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엄마 ‘집유’…法 “반성해서”
-
6
‘오바마 원숭이’ 영상 지운 트럼프…백악관은 ‘직원 실수’ 탓
-
7
조국 “대선 득표율差 겨우 0.91%인데…합당 반대자들 죽일 듯 달려들어”
-
8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9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10
“친구는 주식으로 집 샀다는데”… ‘포모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
1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2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3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4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5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6
연두색 저고리 입고 등장한 김혜경 여사…“예쁘시다”
-
7
국힘 집안싸움 격화… 윤리위, 배현진 징계절차 착수
-
8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
9
오세훈 “장동혁, 당심에 갇혀 민심 못봐…자격 잃었다”
-
10
“코인에 2억4000 날리고 빚만 2200만원 남아” 영끌 청년들 멘붕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랠리’ 끝난 비트코인… NYT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다”
-
2
‘똘똘한 한 채’ 열풍…자가 비율 1위 싱가포르도 못 막았다[딥다이브]
-
3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4
어제 산 깻잎 검은 반점 왜?…“이렇게 보관하세요” [알쓸톡]
-
5
7개월 아기 젖병 물려놓고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엄마 ‘집유’…法 “반성해서”
-
6
‘오바마 원숭이’ 영상 지운 트럼프…백악관은 ‘직원 실수’ 탓
-
7
조국 “대선 득표율差 겨우 0.91%인데…합당 반대자들 죽일 듯 달려들어”
-
8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9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10
“친구는 주식으로 집 샀다는데”… ‘포모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
1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2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3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4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5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6
연두색 저고리 입고 등장한 김혜경 여사…“예쁘시다”
-
7
국힘 집안싸움 격화… 윤리위, 배현진 징계절차 착수
-
8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
9
오세훈 “장동혁, 당심에 갇혀 민심 못봐…자격 잃었다”
-
10
“코인에 2억4000 날리고 빚만 2200만원 남아” 영끌 청년들 멘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I 시대에도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여전히 ‘품질’[기고/문동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25/1322529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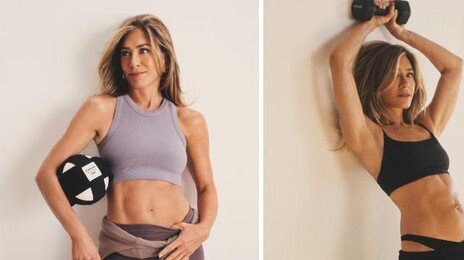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