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건희]벌금으로 끝난 13년 전 ‘미국 고교 총기난사’ 예고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0일 23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올림픽체조경기장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팩스로 날아온 이 한 문장이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를 마비시켰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 130여 명이 출동하고 이용객 2000여 명이 대피했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아이돌 그룹의 공연은 연기됐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5일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에 경찰과 소방대원 240여 명이 출동하고 이용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백화점은 3시간 폐쇄돼 약 6억 원의 손실을 봤다. 협박 글을 쓴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경찰에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들을 접하니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던 13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2012년 3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911신고센터에 “AK-47 소총으로 학생들을 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즉각 대테러팀 44명과 헬기, 장갑차가 출동했다. 인근 초중고교 및 대학 8곳이 봉쇄됐다. ABC뉴스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가 이 사건을 생중계했다.
이 사건의 결말이 궁금해 자료를 찾아봤다. 나라 망신을 산 범죄였지만, 이 씨가 받은 건 벌금 1000만 원이 전부였다. 만약 미국에서 체포됐다면 실형은 물론이고, 수십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었을 사건이었지만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한국 사회는 달라졌을까. 올 3월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됐다. 하지만 벌금형 상한이 2000만 원으로 일반 업무방해죄(1500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 입증 요건도 까다로워 법 시행 후 석 달 동안 적용 사례가 18건뿐이다. 게다가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자체가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허위 협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기관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승소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3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약 500만 원 배상이 명령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테러 위협은 공공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쓸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장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패션 NOW
구독
-

정치를 부탁해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6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7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8
9살 연하 여성 셰프에게 “데이트하자”…피식대학 결국 고개숙여
-
9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0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4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5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6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7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8
9살 연하 여성 셰프에게 “데이트하자”…피식대학 결국 고개숙여
-
9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0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은아]‘베테랑’ 50대들도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11/132168812.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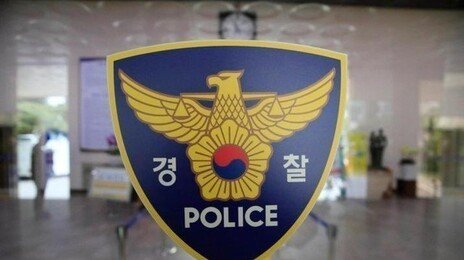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