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민우]암보다 빠르게 번지는 40대 자살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8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엄마였다. 40대 여성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병원에서 의료용 약물을 빼돌려 7세 아들에게 주사해 살해한 뒤 자신에게도 투여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다.
그보다 앞서 8월 26일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세 모녀가 추락사했다. 40대 엄마와 10대 딸 둘이었다. 거주하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채무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그간 자살은 청년층(10∼3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0대에서도 암(24.5%)을 제치고 처음으로 사망 원인 1위가 됐다. 40대 사망자 5명 중 1명(26.0%)이 자살했다. 40대 자살률(36.2명)은 전년 대비 14.7% 늘었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세대’로까지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재난’이 암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저성장 터널 속에서 40대는 경제적 압박과 함께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빚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숨통을 죄어 오는 올가미가 됐다. 실제로 40대의 빚 부담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크다. 올해 6월 말 기준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데 소득은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13.1% 줄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깎였다. 팍팍해진 삶을 사는 40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 실직,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하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가 닥친 뒤 자살률이 높아지곤 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42.3% 폭증했다. 카드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2년과 2003년 자살자 수도 전년 대비 각각 24.5%, 26.7% 늘어났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지난해 26.2명으로 OECD 평균(10.8명)의 2.4배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0명)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에만 1만4872명, 하루 평균 40.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기에 더해 영국처럼 취약 차주에게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숨 돌릴 틈)’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최대 60일간 압류나 추심 등을 막고,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이 제도는 특히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 준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겐 숨 쉴 공간이 절실하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김준일]거대여당 3대 개혁 속도전… 국회개혁 논의는 왜 더디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2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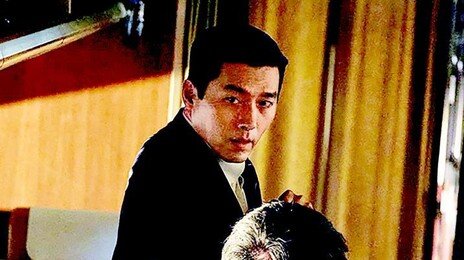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