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나의 지렁이[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2〉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8일 2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내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천 년 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 주면 그 흙이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내 이과 책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렁이의 눈이 보고 싶습니다.
―백석(1912∼1996)
서울에 살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지렁이가 파주에선 자주 보인다. 어떤 지렁이는 너무 커서 ‘흡!’ 숨을 들이마신 뒤 비켜 간다. 도대체 이 많은 지렁이는 어디에 있다 나오는 걸까? 백석은 지렁이가 “장마 지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한다. 지렁이가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니, 놀라운 상상력 아닌가? 빗줄기와 지렁이의 기다란 몸이 닮은 것도 같다.
이 시는 백석의 시집 ‘사슴’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 발표한 동시다. 백석이 자랑하듯 말하는 “나의 지렁이”는 장차 커서 구렁이가 된다. 참으로 스케일이 큰 허풍에 미소가 지어진다. 상상해 보라. “천 년 동안 밤마다” 흙에 물을 주는 상상, 그 흙이 변해 지렁이가 되는 상상, 지렁이가 자라 구렁이로 변신하는 상상! 오묘하고 신기한 일 아닌가? 눈도 없고 얼굴도 없는 지렁이와 꼭 닮은 시처럼 보인다. 장자의 곤과 붕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그런데 천 년 후에 구렁이로 변한 지렁이는 지렁이일까,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닌 걸까?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 헤엄[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3〉](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15/13219454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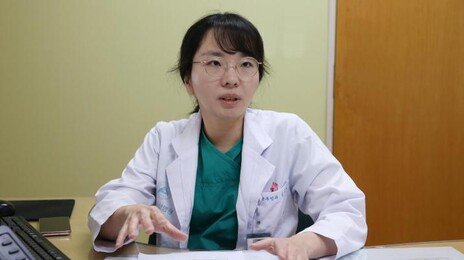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