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양을 사냥한 독수리는 악한 존재일까… 강자를 악으로 보는 약자의 상상[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니체가 분석한 선과 악의 기원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의 결말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속이 후련해지는 까닭은 우리 마음의 양심이나 정의감에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종교의 규율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선과 악으로 엄격하게 정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고 불교에서는 자비와 살생 금지의 계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악이며, 타인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선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윤리적 주체라는 개념이 상상력에 의해 덧붙여진다. 니체는 주체와 작용을 분리한다. 중립적인 존재인 주체는 행위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독수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양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때문에 독수리는 양을 해치는 경우 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과 악이라는 잣대로 독수리에게 윤리적인 구속을 덧씌우면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니체는 독수리가 양을 낚아채 가거나 해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을 ‘화폐 위조’에 비유해 비판한다. 그는 도덕의 이상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묻는다. 양들은 복수심에 불타 간계(奸計)를 발휘해 더 이상 독수리와 같은 악한 존재가 아닌 선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겉과는 달리 마음속에는 강한 독수리를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 양은 독수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선’으로 포장한다. 공격하지 못하는 행위가 선한 것이 되면서 자신이 마치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주의자, 정의로운 자인 척한다. 양이 생각하는 ‘선한 존재’는 ‘능욕하지 않는 자’, ‘상처 주지 않는 자’, ‘공격하지 않는 자’, ‘보복하지 않는 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공정한 자이다. 따라서 인내, 겸손, 공정은 약자인 자신의 덕목이다.
‘약한 것이 공적(덕)’으로,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은 ‘선’으로 바뀐다. 불안한 천박함이 ‘겸허’로 바뀌며, 복종은 명령하는 신에 대한 ‘순종’으로 바뀐다. 그뿐만 아니라 약자의 비공격성, 비겁함, 기다림이 ‘인내’라는 미덕으로 탈바꿈된다. 마땅히 복수해야 할 것에 대해 복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독수리보다 더 훌륭하며 강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자 상상의 결과다. 약자는 힘이 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가치체계 ‘노예 도덕(Slave Morality)’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언젠간 독수리를 이기고자 한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압도할 수 없는 강자를 자신이 꺾었다고 믿는 것은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타자는 악하고 자신은 선하다는 노예 도덕의 거짓 정당화를 이끌어 내는 바탕에는 강한 자의 덕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원한이 크게 작용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도 왜 불행할까… 행복을 가르는 기질과 수용력”[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5/13239170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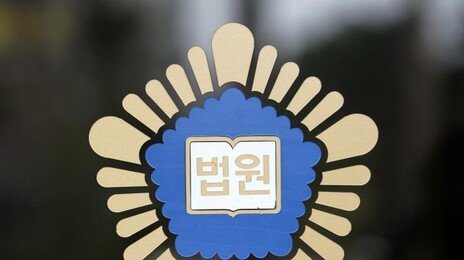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