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68년 8월 21일 진흥왕, 황초령에 순수비 세우다[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황초령비에 새겨진 연도는 진흥왕 29년(568년) 8월 21일(음력)이다. 마운령비도 비문을 통해 같은 때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산비는 연도 부분이 없어졌지만 비석이 황초령비, 마운령비와 동일한 규격인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석들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제작돼 각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비는 무학대사의 비석이다. 마운령비는 남이장군이 세운 비석으로 알려졌는데, 황초령비는 그래도 일찍 탁본이 만들어져 신라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이 비석의 탁본을 뜬 사람은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전사한 신립이었다. 신립이 북병사로 있을 때 황초령비의 탁본을 떴고, 선조의 손자인 낭선군은 ‘대동금석서’에 탁본을 수록해 세상에 전했다. 영조 때에는 함경도관찰사 유척기가, 정조 때는 함흥부사 윤광호가 탁본을 떴다 하니 그때까지는 비석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비석이 높은 곳에 있고 탁본을 뜨는 일이 번거로웠던 탓인지 백성들이 비를 파묻었다고 한다. 떨어뜨려 깨뜨린 뒤에 파묻은 것이다. 정조 14년(1790년)에 함흥판관 유한돈은 홍양호의 부탁으로 비석을 찾아봤는데 부서진 한 조각만 간신히 찾아냈다.
현재 이 비석들은 북한 함흥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일본의 식민사학자 쓰다 소키치는 “신라가 이렇게 북방까지 진출했을 리 없다”며 황초령비를 위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29년 황초령보다 북쪽에서 마운령비가 발견되면서 이 주장은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황초령비의 역사는 단순한 석비 발견의 과정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기록이 보존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누군가의 호기심과 집념, 그리고 우연이 맞물릴 때 역사는 다시 빛을 본다. 김정희의 깊은 관심 덕분에 황초령비는 사라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다. 역사는 발견 그 자체가 끝이 아니다. 세대를 거듭한 지속적인 관리 속에서 완성된다.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1460년 9월 11일 신숙주, 여진 정벌 승전보를 알리다[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0/13236304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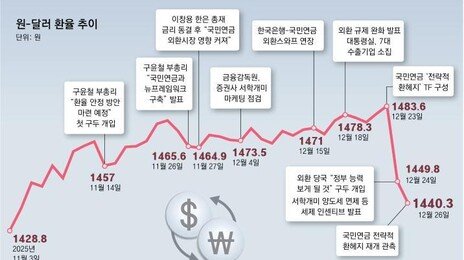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