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산재 청정국’… 안전한 세상에는 비용이 든다[기고/함인선]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이 많은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자 비율은 그대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은 절반이라니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 비정상은 산재 사망자와 1인당 GDP를 곱해 얻는 ‘소득반영 산재 사망률’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압도적 1위인데 2위 캐나다의 3배, 13위 영국의 26.3배다. 소득이 1.5배인 영국에서 1명 죽을 때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26명이 죽는다는 얘기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왜 ‘킬링필드’가 됐으며, 바뀌지 않고 있을까?
첫째는 저비용 고위험으로 구조화된 건설업 생태계 때문이다. 개발시대 이후 ‘싸게 빨리’는 한국 건설업의 미덕이었고 모든 건설비용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안전을 우선한답시고 가격과 공기를 못 맞추는 업체는 도태됐다. 본사가 실행가와 준공 시점을 정해 보내면 현장 소장은 안전비용을 포함해 부대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동시 공정이라도 해야 한다. 우레탄 발포와 용접 작업을 같이 하다 40명이 죽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내부공사를 위해 동바리를 해체하다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그 사례다.
둘째는 건설 안전의 확보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과의 전쟁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자살과 더불어 산재 사망을 5년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설이 산재 중 가장 심각함을 깨닫고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 특위’를 구성했다.
필자는 20억 원 이하 공사에서 54%가 사망한다는 통계를 보이면서 동네의 소형 공사가 사고 사망의 주범임을 역설했다. 공감을 얻어 건설안전특별법 초안에는 건축주 직영 철폐, 소형건설업면허제, 감리공영제 등의 처방이 담겼으나 결국은 없던 일이 되었다. 주택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국토부 내부의 반대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급격한 산업화,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아파트 용지를 싼값에 공급해 지금의 대형 건설사를 키운 것도, 다세대 주택을 비공식 부문에 맡겨 이른바 ‘집장사’를 키운 것도 역대 정부다. 한때 우리와 비슷했던 영국은 ‘기업살인법’ 제정과 모든 산재의 기소를 통해 건설 산재 청정국이 됐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처벌로 건설업계의 관행은 어쨌든 바뀔 것이다. 그러나 부족하다. 안전한 세상은 비싼 것임을, 이를 위해서 집값은 오를 수도 있다는 어려운 설득 또한 정부의 몫이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천광암 칼럼
구독
-

사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복 80주년, 시급히 풀어야 할 이산가족의 한[기고/김철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16/1324028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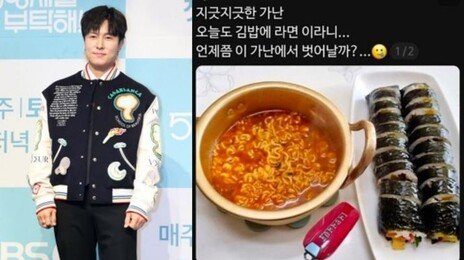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