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원재]‘통계의 어머니’ 인구주택총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6일 23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가 시작된 건 1925년으로 일본, 대만보다 5년 늦다. 일제가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사 계획을 5년 연기한 탓이다. 실제로 1920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이 일본 기자에게 “조사원으로 활용할 고등보통학교(중고교) 상급생과 졸업생이 모두 독립사상을 갖고 있어 곤란하다”며 하소연하는 대목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뒤 시작됐지만, ‘호구조사 나왔냐’는 말이 오늘날까지 핀잔으로 통할 정도로 조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심했다.
▷일제가 수탈 목적으로 한 조사라 더 그랬겠지만 사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사생활을 캐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에는 직장 이름과 직책, 결혼 및 자녀 계획, 1인 가구가 된 이유 등 요즘 친인척도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을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10년 전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13개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며 조사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조사원이 물어야 할 항목이 42개에 달한다. 올해도 조사원 3만 명이 전체의 20%인 500만 표본 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100년 전 첫 조사에서 이름, 성, 연령, 결혼 유무, 국적 등 5개뿐이던 조사 항목이 늘어난 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늘면서 한국 입국 시기, 한국어 실력,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5년 전 반려동물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시대 변화와 함께 빠진 항목도 있다. 1960년대는 화장실 형태, 1970년대는 상수도 시설 유무, 1980년대는 목욕 시설 유무를 물었지만 지금은 위생 관련 항목은 묻지 않는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묻는 항목은 2000년에 처음 포함됐다가 곧 사라졌다.
▷100주년을 맞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면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 모바일, 전화로도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의 어머니’로 불린다. 모든 통계의 ‘모집단’을 구성하며 고용, 복지,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되기 때문이다. 100주년에 걸맞은 내실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DBR
구독
-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김재영]‘매력’으로 인구 절벽 넘는 도시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27/13264722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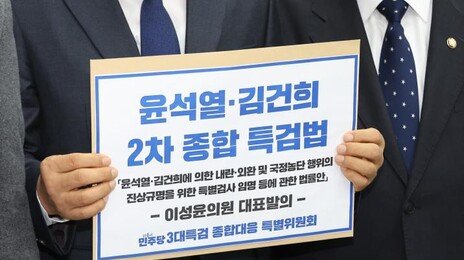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