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상담사’가 찾은 복지사각 26만명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자체 공무원의 초기 조사 대체
1년간 43만명 통화해 대상자 분류
위기 가구에 생계지원-취업 연결
“최종 평가와 보완은 사람이 맡아야”
50대 김모 씨는 최근 거주지 주민센터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메시지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AI 복지 상담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30분 뒤 김 씨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발신자는 자신이 ‘인공지능(AI) 상담사’라고 밝힌 뒤 “체납, 채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씨는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최근 직장을 잃어 힘들다”고 답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업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었다.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26만 명이 지자체와 연결돼 긴급 생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상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AI 상담사가 1년간 43만 명 상담
정부는 매년 6차례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파악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 심층 상담과 가구 방문 상담을 진행해 사회보장급여를 주거나 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AI 상담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초기 상담은 자동전화 시스템이 담당한다. AI 시스템이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에 기반해 상담한다. 건강, 경제 상황, 고용위기 등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한 뒤 위기 정보와 관련해 추가 질문을 던져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한다.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상담 도중에 대상자가 전화를 끊더라도 우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 내용은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고 이후 심층 상담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상자가 전화를 받도록 미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내한다. 긴급하게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함께 전달한다.
● “AI 상담 오류 가능성… 인간이 보완해야”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복지 관련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에 AI를 활용해 예산과 비용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AI 상담과 사기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사기로 판단해 상담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가 오류를 일으키는 등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며 “AI가 복지 수요를 찾아내면 사람이 평가하고 보완하는 등 사람과 AI가 함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4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5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6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7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8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9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0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3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4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5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6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7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
8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9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0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4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5/13316847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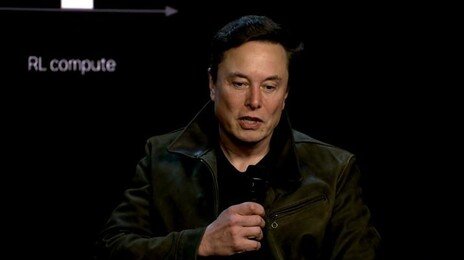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