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보다 구옥이 좋아”…MZ의 ‘고쳐 쓰는 집’ 열풍[트렌드 발굴소]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9월 6일 14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허물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재생 건축’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집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자기 개성을 담으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첫째 이유는 가격, 개성은 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는 청년들이 구옥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들었다.
■ “재료를 살릴수록 비용도 절약, 멋도 살아”

리모델링에서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 기존 디자인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새로운 재료를 쓰면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지만, 오래된 자재를 활용하면 공사비를 낮출 수 있고 동시에 공간에 ‘시간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옛 재료가 가진 흔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건물이 겪어온 시간을 현재까지 이어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모두 새 자재로 교체하면 과거의 흔적이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구옥 리모델링은 비용 절약과 창의적 디자인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식으로 꼽힌다.

노후 주택을 고쳐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체는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이 외의 부분은 꼭 필요한 곳만 손보고, 가능한 한 기존의 멋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에너지와 자재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는 효과도 생긴다.
■ “집에서 미술관·카페로도 변신”

재생 건축은 주택을 넘어 공공·상업 공간에서도 활용된다.
홍 교수는 런던의 발전소 건물이 미술관으로 변신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이던 자리에 들어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외관을 살려 새 용도로 재탄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신축의 대안 아닌, 지속 가능한 해법”

리모델링은 단순히 신축 대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홍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며 “대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앞으로는 수선과 고쳐 쓰기가 정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트렌디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책터뷰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트렌디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4
“정청래 잘한다” 38%, “장동혁 잘한다” 27%…당 지지층서도 두자릿수 하락
-
5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6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7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8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9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10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5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6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7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
8
연두색 저고리 입고 등장한 김혜경 여사…“예쁘시다”
-
9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10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4
“정청래 잘한다” 38%, “장동혁 잘한다” 27%…당 지지층서도 두자릿수 하락
-
5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6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7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8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9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10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5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6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7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
8
연두색 저고리 입고 등장한 김혜경 여사…“예쁘시다”
-
9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10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올해도 한복 챙겼개”…반려동물 ‘명절 문화’ 확산[트렌디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6/13247161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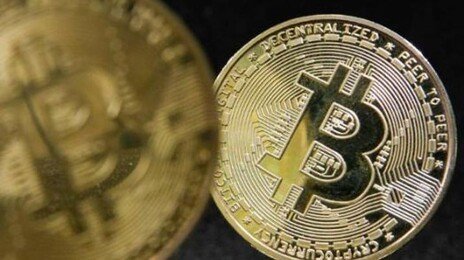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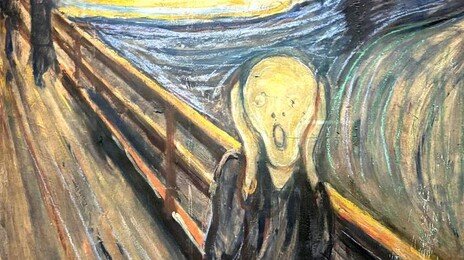
댓글 0